◇2021 신춘문예당선소설집/이지은 외 21명 지음/538쪽·1만8000원·한국소설가협회


8년 전 대학 문예창작학과에서 소설 창작 수업을 듣던 때였다. 종강이 다가오자 담당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지했다. 한 학기 내내 쓰고 토론하고 퇴고한 작품으로 각 신문사의 신춘문예에 응모하라는 것. 자신의 습작이 형편없다고 생각되더라도 ‘도전’에 의미를 두라는 뜻이었다. 수업에서 연거푸 교수 지적을 받고 다른 학생의 날카로운 비평에 좌절했던 학생들은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냈다. 작품의 오탈자를 고치고 프린트한 뒤 황색봉투에 ‘신춘문예 응모작품’이라고 써서 신문사에 보냈다. 혹시 우체국 등기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수강생들의 모습이 기억난다.
이 책은 2021년 전국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작들을 모은 작품집이다. 대부분 주최한 신문사들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작품들이지만 한 책으로 모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맘때면 ‘문청’들이 이 책에 담긴 전년도 당선작들을 분석하며 올해 어떤 작품을 쓸지 고민한다. 신인 작가들의 뼈를 깎는 노력의 결정체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문학 팬들의 시선도 끈다.
당선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며 눈길이 간 건 그들의 연배가 생각보다 높다는 거였다. 202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밸런스 게임’으로 당선된 이소정 씨(43)를 비롯해 오랫동안 꾸준히 글을 써온 작가들이 꽤 있었다. 이 책을 묶어낸 한국소설가협회의 김호운 이사장이 “오랜 시간 인고의 노력으로 문학을 갈고닦아 소설가로 입문했기에 그 영광이 더욱 빛난다”고 당선자들을 격려한 이유가 이해된다.
11월에 들어서니 신문사들이 속속 신춘문예 공고를 내고 있다. 1925년 국내 최초로 신춘문예를 도입한 동아일보사 역시 2022년 신춘문예 작품을 12월 1일(수)까지 공모한다. 혹 문청들이 자신의 작품이 떨어질까 우려해 응모 자체를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신춘문예에 응모하고 난 뒤 우체국에서 등기 영수증을 받는 ‘도전’만으로도 조금 더 문학적인 삶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호재의 띠지 풀고 책 수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동아시론
구독 38
-

고양이 눈
구독 91
-

프리미엄뷰
구독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1개
-
- 화나요
- 1개
![[이호재의 띠지 풀고 책 수다]1인 출판 창업, 지금이 기회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11/19/11034093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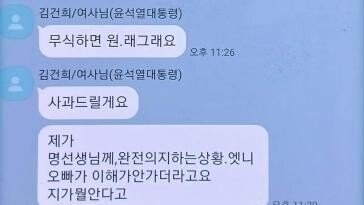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