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공화국/앤서니 그래프턴 지음/강주헌 옮김/648쪽·3만8000원·21세기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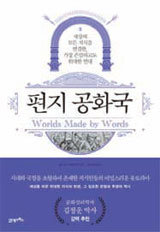
라이프니츠와 뉴턴은 미적분학과 현대물리학을 확립한 과학자다.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역사학자이기도 했고 언어의 기원과 발전을 연구했다. 뉴턴은 고대 역사를 탐구하고 성서의 예언들을 해석했다. 이런 넓은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었던 토대가 편지 공화국이었다. 여기서 지식인들은 라틴어 어법부터 세계의 개혁까지 모든 것을 논의했다. 학문은 개인의 서재를 넘어 세계를 연결하는 공동 프로젝트였다.
이 공화국은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사이, 16∼18세기 유럽과 북미에 존재했다. 국경도 정부도 수도도 없이 관습과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지식인들의 연결망이었다. 저자가 마음대로 해석해 붙인 이름이 아니라 당대 학자들이 실제 사용한 표현이었다.
이 편지 공화국의 공용어는 라틴어였고 후에 프랑스어가 추가됐다. 시민들은 대부분 여러 분야에 박식한 전인적 지식인이었다.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지식을 교류했을 뿐 아니라 학문의 경계도 뛰어넘었다. 갈릴레이는 지동설 때문에 고국인 이탈리아에서 사면초가에 몰렸지만 먼 프라하에서 케플러가 보낸 편지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얻었다. 실제의 인적 교류도 따랐다. 젊은 학자가 선배 학자의 추천서를 들고 고명한 학자를 찾아가 라틴어로 인사를 건넨 뒤 고전 문헌에서 토성의 고리까지 어떤 주제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이 공화국에 단일한 이데올로기나 믿음 체계는 없었다. 견해가 다르다고 의사소통 자체를 끊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잘못된 일로 여겨졌다. 16세기 프랑스 신학자 카스텔리오가 교황청의 이단 박해를 반대하자 수많은 편지 공화국 시민들이 그를 따라 절대주의에 반대하는 깃발을 들었다. 저자는 “편지 공화국과 관련된,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역사는 아직도 쓰여야 할 것이 많다”며 한층 치열한 연구를 다짐한다.
아쉬움도 남는다. 지식사학자인 저자가 여러 매체에 발표한 에세이와 논고를 모았기에 책의 체제가 단일하지 않다. ‘편지 공화국’에 대한 내용은 앞부분, 특히 1장에 집약된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