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의 역설/허먼 폰처 지음·김경영 옮김/503쪽·2만5000원·동녘사이언스


하지만 웬걸. “운동해서 살 뺀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며 으름장을 놓는 한 학자의 지적이 담긴 교양과학서가 때마침 나왔다. 아무리 운동으로 땀을 빼도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말에 슬금슬금 배신감이 차오를 정도다.
사실 운동만으로 살 빼기 어렵다는 주장은 그리 낯설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 듀크대 진화인류학과 교수인 저자는 이를 꽤나 치밀한 연구를 통해 낱낱이 파헤친다. 대충 설파하는 허풍이 아니란 소리다.

책에 따르면 하드자족 성인 남성은 하루 평균 14km를 걷는다. 농사를 짓지 않아 음식을 구하려면 초원을 매일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 하드자족 남성이 태어나 70대까지 걷는 거리는 평균 38만4000km.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와 거의 비슷할 정도다.
그런데 묘하게도 하드자족의 에너지 소비량은 그다지 높지 않다. 예를 들어 체중이 110파운드(약 50kg)인 하드자족 성인 남성의 일일 에너지 소비량은 2500kcal에 불과했다. 체중이 같은 미국이나 영국, 네덜란드, 일본, 러시아 등의 성인 남성 일일 에너지 소비량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온종일 걷거나 뛰어다니는데도 도시인들과 에너지 소비량이 비슷한 것이다. 체중이 다른 이나 여성으로 두 집단을 비교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폰처 교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배경에 ‘에너지 균형’이 작용한다고 진단한다. 에너지 균형이란 신체가 고강도 활동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면 다른 에너지 소비를 자동으로 절약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많이 하면 인간의 몸은 스스로 기초 대사량을 줄여버린다.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인 면역력이나 다친 신체 조직을 복구하는 속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결국 운동으로 열심히 땀을 빼도 다이어트엔 별로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단기적으로야 살이 빠질 수 있지만 결국엔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슬픈(?) 주장을 저자는 담담하게 전한다.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 폰처 교수는 병을 주면서 약도 줬다. 그래도 운동이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엔 도움을 준단다. 먼저 식단 조절로 살을 뺀 뒤에 꾸준히 운동하면 적어도 ‘요요 현상’은 막을 수 있다고 다독거린다. 또 건강을 위해서는 신진대사 조절 능력을 높이는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비만, 당뇨, 고혈압을 일으키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현대인들이 웰빙할 수 있는 비결은 역시 운동밖에 없단 소리다.
운동 안 하고 살 좀 빼는 비법이라도 얻을까 싶어 책을 들었던 이들에겐 입이 삐죽 튀어나올 얘기겠지만, 뭐 원래 삶이란 그런 거다. 고민한답시고 앉아 있지 말고 일단 나가서 걸어야 한다. 그럼 이 책도 얼른 덮어야 하는 게 아닌지…. 살짝 헷갈리긴 한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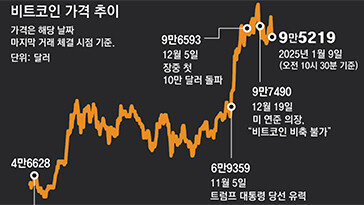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