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구리가 산책 중인 강아지를 놀라게 하고 족제비가 카페를 기웃거린다. 대한민국에서 최근 일어난 일들이다. 2017년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멧돼지가 나타나 뛰어다녔다.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 뉴욕 부근 뉴저지 주에는 흑곰 5000마리가 산다. 반세기만에 200배 이상으로 늘었고 알래스카보다 면적당 곰 밀도가 높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산타바바라캠퍼스 환경학 교수인 저자는 1970년대 이후 북아메리카와 유럽, 동아시아의 도시들이 야생동물들과 함께 사는 ‘어쩌다 숲’이 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인간을 위해 설계된 도시는 어떻게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공간으로 바뀌게 됐을까.
대부분의 도시는 본디 동물들이 살기 좋은 지역에 터를 잡았다. 기후가 쾌적한데다 깨끗하고 풍부한 물, 풍족한 식물군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였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도시들을 광범위한 교외 마을의 군집으로 바꾸어 놓았다. 동물들은 낮에 교외 마을에서 음식과 물을 얻고 밤에 은신처로 돌아갔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모기잡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새가 야생동물의 도시 귀환에 중요한 주역이 됐다. 1991년 새크라멘토 시는 이 새가 사는 관목의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자연사회보존계획(NCCP)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를 본 딴 프로그램을 26년 뒤 29개 도시가 마련했고 11개 도시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도시 교외 주민들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건설을 억제하고 주거 밀도의 한계를 정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교외는 야생동물에게도 덜 적대적인 장소가 됐다.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늘어도 도시에서 살 수 있는 종(種) 수는 한정되기 마련이다. 도시 야생동물의 이야기는 결국 ‘소수의 성공 스토리’다. 도시는 치열한 진화의 실험실이기도 하다.
야생동물이 모일 수 있는 도시는 인간에게도 이득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동물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복원하면 녹지가 늘어나고 도시 열섬이 줄어든다. 하천을 잘 가꾸면 수변 공원이 생기고 홍수의 위험도 줄어든다. 숲을 잘 가꾸면 공기를 정화하고 물을 저장해준다.
결국 인간과 동물이 서로 잘 살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도시의 과제라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미국보다 도시화가 훨씬 진행된 아파트 숲 속의 한국인에게 더 절실한 과제일지도 모른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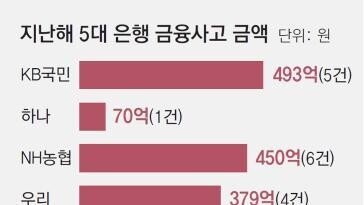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