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프리즌/셰인 바우어 지음·조영학 옮김/428쪽·1만8000원·동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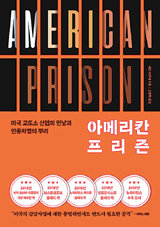
“지옥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암흑의 동굴입니다.”
미국 잡지 ‘마더존스’의 기자인 저자가 2014년 루이지애나의 한 민영 교도소에 4개월 동안 교도관으로 위장 취업해 목격한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다. 2.5m² 남짓한 감방에 재소자 2명을 몰아넣었다. 조명이 나간 채 방치된 복도는 한낮에도 어두컴컴했다. 방바닥에는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 종이 뭉치가 굴러다녔다. 재소자들은 그들을 관리하는 교도관에게 “우리가 개똥만도 못하냐”며 고함을 질러댔다. 하지만 각 층별 교도관 수는 재소자 176명당 1명꼴. 온갖 소란과 열악한 환경을 그저 방기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
책은 미 전역의 재소자 150여만 명 가운데 13만 명가량을 책임지는 미국 민영 교정회사(CCA) 소속 교도관으로 근무한 저자가 민영화 교도소의 실태를 고발한 르포르타주다. 비좁은 감방 안에 진동하는 악취와 온갖 쓰레기가 널브러진 열악한 내부를 눈으로 들여다보는 듯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당대 지역의 제조업자들은 교도소 안에 공장을 지어 교도소 한 곳당 현재 기준으로 연간 평균 22만 달러(약 3억1460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냈다. 교정보다 ‘수익 창출’이 우선시되면서 교도소는 값싸고 열악한 환경에 최대한 많은 죄수들을 몰아넣는 공장이 되어버렸다.
비단 남의 나라 일일까. 추천사를 쓴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의 교정 현실과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2010년 전체 54개 교정시설 가운데 첫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가 등장했다. 비용과 편익, 효율성만 중시한다면 언제든 다른 나라의 교도소도 미국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저자의 지적은 한국 사회에도 유효하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