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책 ‘우화’ 그린 폴란드 작가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화상인터뷰

왼쪽과 오른쪽 페이지에 사내가 각각 한 명씩 있다.
살짝 벗겨진 머리,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셔츠, 바지 아래로 드러난 맨발…. 두 사내의 생김새는 쌍둥이처럼 유사하다. 양손으로 기다란 막대기를 들고 있는 포즈마저 똑같다.
그런데 왼쪽 사내가 든 막대기는 끝이 뭉뚝한 삽이다. 왼쪽 사내는 삽 위에 빵을 올린 뒤 오븐에 넣고 있다. 반면 오른쪽 사내가 든 막대기의 끝은 뾰족하고 빨갛다. 누군가를 찌른 직후 붉게 물든 창(槍)이다.
“유럽 사람들에게 빵을 굽는 일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같은 포즈를 한 사내의 손에 창이 들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그림이 전혀 달라지죠.”
이보나는 세계 3대 아동문학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탈리아 볼로냐 라가치상을 3차례 수상한 국제적인 그림책 작가다. 올 3월 한국인 최초로 이수지 작가가 수상해 널리 알려진 ‘어린이책의 노벨 문학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최종 후보에도 3차례 올랐다.
그는 신작에서 평화와 폭력을 대비시킨다. 한 페이지에서 왼쪽 여자의 손엔 우산이, 오른쪽 여자의 손엔 총이 쥐어져있다. 다른 페이지에서 왼쪽 남자의 손엔 꽃다발이, 오른쪽 남자의 손엔 수갑이 채워져 있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전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을 때 독자들은 그림에서 다른 것을 찾아내죠. 제 목소리는 작아서 폭력과 전쟁을 멈출 수 없어요. 다만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죠.”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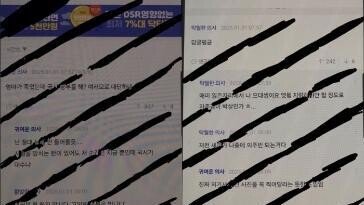

![美도 홀린 K뷰티… 프랑스 제치고 美 수입시장 첫 1위[횡설수설/김재영]](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80856.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