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살던 집서 일상 기록
“글 쓰며 나 자신 사랑하게 돼”
◇아치울의 리듬/호원숙 지음/272쪽·1만6000원·마음의숲

2011년 타계한 한국 문학의 거장 박완서(1931∼2011)는 생전 경기 구리시 아치울에 집을 지으며 마당에 붉은 모란 두 그루를 심었다. 그의 딸인 수필가 호원숙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그 곁에 하얀 모란을 심었다. 모녀가 심은 모란 세 그루 아래, 지난해부터 또 다른 새끼 모란이 분홍 빛깔을 내며 피어났다. 노년의 모친을 돌보는 등 어머니의 ‘집사’로 살아왔던 저자가 자기만의 글을 쓰며 또 다른 ‘나’를 꽃피운 것처럼….
저자가 누군가의 딸이 아닌 ‘수필가 호원숙’으로,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아치울에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에세이다.
저자는 언젠가부터 자신의 일상이 된 글쓰기에 대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영감을 줬고 아름다웠으므로 그때그때 잊지 않기 위해 쓰게 됐다”고 고백한다.
어머니와 함께한 추억도 담았다. 저자는 고교 2학년 때 어머니의 첫 소설 ‘나목’이 처음 출간된 때를 떠올리며 “문장 하나하나가 후벼 파듯이 다가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던가. 밥을 먹지 못하고 첫 책을 읽던 딸 방 앞에서 서성이던 어머니의 모습이 꿈속만 같다”고 했다. 어머니의 원고를 받아 근처 신문사나 잡지사에 갖다 주는 일은 어린 딸에게 “뿌듯하고 거룩한 일이었다”며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도 드러냈다. 어머니가 드나들던 안방과 손때가 묻은 소반, 삐걱대던 대문 소리까지 저자가 떠올린 어머니와의 추억들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어떤 날엔 꽃과 나무에 관해, 또 어떤 날엔 TV 프로그램과 영화, 시에 관해 생각나는 대로 쓴 이 책은 저자의 말대로 “억지로 쥐어짜지 않고 목적 없이 쓴 글”로 채워져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글을 쓰면서 나 자신을 알게 됐고 나만이 가진 언어의 리듬과 감각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고 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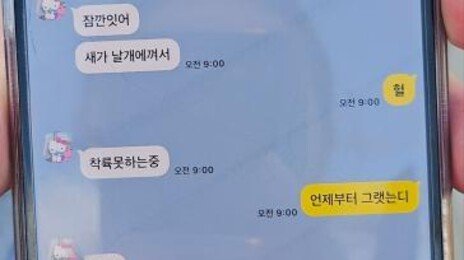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