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별세한 미국 현대문학의 대가
어린 아들과의 여행서 얻은 통찰로
어둠 속 빛 찾는 아버지 모습 그려
◇로드/코맥 매카시 지음·정영목 옮김/328쪽·1만3000원·문학동네

13일(현지 시간) 향년 90세로 별세한 미국 현대문학의 대표 작가 코맥 매카시에겐 늦둥이 아들이 있다. 64세에 낳은 아들 존 매카시다. 작가는 2009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존과 함께 있는 시간을 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아들에 대한 애정을 듬뿍 드러내곤 했다. 한마디로 ‘아들 바보’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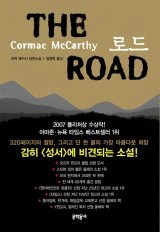
여행은 쉽지 않다. 인간을 사냥하는 이들을 피해 조심히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 아버지는 매일 밤 피를 토하며 잠에서 깰 정도로 몸이 좋지 않다. 위험에 처할 때마다 아버지는 고민한다. 더 큰 고통을 겪기 전에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아버지는 두려움에 떠는 아들을 다독이며 버틴다. “그래도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우린 아직 여기 있잖아.”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는 아버지의 투쟁은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로드’는 2007년 미국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영화 ‘더 로드’(2010년)로 만들어졌다. ‘핏빛 자오선’(1985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2005년)로 명성을 얻은 그는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우뚝 섰다.
‘로드’ 서문엔 “이 책을 존 매카시에게 바친다”고 썼다. 작가는 ‘로드’ 250부에 자신의 서명을 남긴 뒤 아들에게 물려줬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서명한 ‘로드’는 모두 존의 것”이라고 했다.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던 코맥 매카시가 자택에서 사망한 사실을 출판사에 알린 것도 그의 아들 존이다. ‘로드’에서 아버지가 죽는 순간 아들에게 남겼던 말이 마치 코맥 매카시의 유언처럼 읽힌다.
“나는 같이 못 가. 하지만 넌 계속 가야 돼. 길을 따라가다 보면 뭐가 나올지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늘 운이 좋았어. 너도 운이 좋을 거야. 가보면 알아. 그냥 가. 괜찮을 거야.”
이호재의 띠지 풀고 책 수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e글e글
구독
-

손효림의 베스트셀러 레시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독자와의 만남이 내겐 바캉스예요”[이호재의 띠지 풀고 책 수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3/07/07/120129803.6.jpg)


![귤 5㎏ 샀는데 4.5㎏만 보낸 판매자…“가득 담으면 터져서” [e글e글]](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72132.3.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