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의 유령/다카노 가즈아키 지음·박춘상 옮김/356쪽·1만7000원·황금가지

1994년 늦가을, 30대 남성 열차 기관사 사와키 히데오는 열차를 운행하다 ‘실루엣’과 마주쳤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실루엣은 사람처럼 보였다. 당황한 사와키는 오른손으로 브레이크장치를 돌려 열차를 급정지시켰다. 선로를 확인했지만 사고 흔적은 없었다. 역무원도 “접촉 흔적은 없다. 신원 미상자도 발견 못 했다”고 했다. 실루엣은 바람에 날아간 듯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실루엣은 사람이었던 걸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일본 ‘사회파’ 추리소설 작가로 꼽히는 다카노 가즈아키의 신작 장편소설이다. 가즈아키가 장편소설을 펴낸 건 일제의 제노사이드(대량 학살)를 비판적으로 다룬 장편소설 ‘제노사이드’(2012년·황금가지)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소설은 1962년 도쿄 열차 추돌사고 사망자 160명 중 한 명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모티프로 했다.
소설은 월간지 기자 마쓰다 노리오가 심령 특집 기사를 취재하며 시작된다. 마쓰다는 선로에서 한 여성이 희미하게 찍힌 제보 사진을 받는다.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목격자와 경찰을 만나던 마쓰다는 여성의 실체가 과거 열차 사고로 사망했던 인물이라는 정황을 파악한다. 흥미를 끌 만한 기삿거리를 찾아다니던 마쓰다는 조금씩 ‘왜 여성의 혼이 지상을 떠나지 못하는지’ 궁금해한다. 마쓰다가 여성의 ‘유령’을 마주한 뒤 2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의 혼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다가 절망하는 심리를 애절하게 그렸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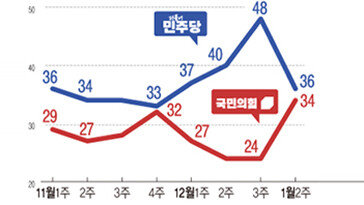
![[광화문에서/홍정수]1·6 폭도와 反탄핵 시위대… 한미의 아슬아슬한 평행선](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833386.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