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면성 지닌 인간 행동의 원인… 생물-심리-문화적으로 설명
순간에 영향 주는 뇌신경학적 동인… 며칠 전서 태아기 경험까지 이어져
타인 돕는 것은 오랜 진화의 산물
◇행동/로버트 M 새폴스키 지음·김명남 옮김/1040쪽·5만5000원·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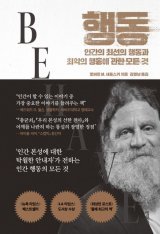
인간은 전쟁을 벌여 수천만 명을 죽이지만 동시에 얼굴을 마주치는 적군과 쉽게 유대를 느끼는 존재이기도 하다. 남북전쟁 때도 병사들은 적과 서로 친해져 물물교환을 하거나 전투를 앞둔 저녁에 공동으로 예배를 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전에서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 휴전’이 있었던 건 잘 알려져 있다.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모순적으로 행동하는 걸까. 부제 ‘인간의 최선의 행동과 최악의 행동에 관한 모든 것’처럼 인간의 폭력성과 이타성이라는 양면, 도덕성과 자유 의지, 부족주의와 외국인 혐오 등에 대해 ‘생물학과 심리학, 문화적 측면을 종합해’ 다룬 책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신경과학자인 저자가 집필에만 10년 넘게 걸린 역작으로, 인용한 연구의 출처를 밝힌 후주(後註)만 얇은 책 한 권 분량이다.
행동하기 ‘몇 초에서 몇 분 전’은 감각의 시간대다. 실험에 따르면 우리 뇌는 피부색에 매우 예민하다. 누군가의 얼굴 사진을 10분의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보여주면 사람들은 뭘 보기는 한 것인지마저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진으로 본 얼굴의 인종을 맞히라면 꽤 잘 맞힌다. 피험자와 다른 인종의 얼굴을 보여주면 편도체가 더 잘 활성화되기도 한다. 이는 인간의 뇌가 ‘우리’와 ‘그들’을 순식간에 가른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 무조건 지배되는 존재는 아니다. 저자는 “의식이 감지할 만큼 오래(약 0.5초 이상) 노출되면 뒤이어 이마앞엽 겉질이 활성화되고 편도체가 조용해진다. 스스로도 불편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했다.
책은 이런 식으로 ‘몇 시간에서 며칠 전’의 호르몬 이야기와 ‘며칠에서 몇 달 전’의 신경가소성을 살핀 뒤 청소년기, 아동기, 태아기에 겪은 변화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다. 뒤이어 문화와 진화로 주제를 넓혀 간다. 저자는 사람이 누군가를 돕는 것에 대해선 “자전거 타기처럼 오래전부터 몸에 익힌 나머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행동의 문제”라고 했다. 위트 있는 문장과 풍부한 사례를 통해 전개하니 책의 두께에 지레 겁먹을 것은 없다. 원제 ‘Behave’.
-
- 좋아요
- 4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