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년에 달하는 술-인류 대서사
경쾌하고 위트 있는 문체로 풀어
“금주법, 가정폭력 탓” 등 이색적
◇주정뱅이 연대기/마크 포사이스 지음·임상훈 옮김/312쪽·1만8500원·비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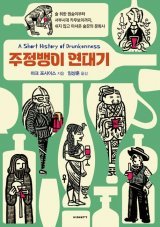
“때로는 폭력을 일으키고 때로는 평화를 알선하며, 가난한 이들의 위안이자 가난의 원인이기도 한 모순덩어리”가 있다. 바로 술이다.
신간은 이처럼 술이 인류에게 미친 방대한 역사를 풀어냈다. 단어의 유래와 숨은 뜻을 연구하는 데 천착해 온 작가가 썼다. “인간은 술을 마시도록 진화해 왔다”는 주장으로 시작되는 대서사는 고대 이집트와 중세 유럽, 근대 미국 등으로 이어지며 시대와 지역을 폭넓게 망라한다.
약 1만 년에 달하는 역사를 짚지만 지루하지 않다. 수다쟁이 동료의 이야기를 듣는 듯 경쾌하고 위트 있는 문체가 강점이다. 기원전 1300년경 고대 이집트인이 남긴 ‘과음 후 토하는 여성’ 벽화, ‘인간의 인격을 시험하기엔 와인을 마시는 것보다 적합한 것이 없다’는 플라톤의 말 등 눈길 끄는 자료들을 다채롭게 활용했다.
술의 제조법이나 멋있게 마시는 법 등을 주로 다루는 ‘술 책’들과는 색다른 지적 충족감도 준다. ‘불콰한 시골 사람들이 여관 선술집에 모여 거품 가득한 맥주를 들이켠다’는 중세풍 콘텐츠의 전형성을 깨는 대목이 그렇다. 저자는 “오늘날 고급 호텔과 동격인 여관이 시골에 존재하기란 불가능했고, 선술집은 와인을 파는 곳이었다”고 말한다.
흥미로운 주장이 다수 제기되지만 근거가 살짝 빈약한 점은 아쉽다. 저자는 “기원전 9000년경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이유는 식량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오직 술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맥주는 빵보다 만들기 쉽다’는 등의 논리를 들지만, 과학적인 설득력은 부족해 보인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밑줄 긋기]삶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3/14/131209154.4.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