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가장 오래된 서점 중 한 곳
‘헨리 소서런’의 신기한 이야기
마치 모험담-오컬트 소설 읽는 듯
◇기묘한 골동품 서점/올리버 다크셔 지음·박은영 옮김/368쪽·2만 원·알에이치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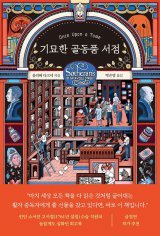
1761년부터 260년 넘게 문을 열고 있는 한 서점이 있다. 영국 런던의 퇴락한 골목에 을씨년스럽게 버티고 있는 ‘헨리 소서런’.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 중 하나다. 저자는 이곳의 삐걱대는 책장 빼곡한 고서적을 관리하는 직원이다. “빅토리아 시대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정체불명의 괴짜 방문객들에게 맞서면서도 이 골동품 서점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책으로 풀어냈다.
에세이지만 모험담과 오컬트를 버무린 소설을 읽는 듯하다. 저자는 흡인력 있는 전개와 문체를 갖춘 스토리텔러다. 소서런이 거액을 들여 매입했으나 지구 반 바퀴를 돌고서도 팔리지 않았던 책에 얽힌 저주를 풀어낸 대목이 그렇다. 책은 겨우 주인을 찾을 뻔했으나 타이타닉에 실려 영원히 바다로 침몰했고 제본업자는 몇 주 뒤 익사했으며, 다시 제작된 책은 독일의 공습으로 산산이 조각나는 결말을 맞는다.
‘덕후’들의 구미를 당길 깨알 같은 주석도 소소한 재미다. 저자가 희귀 서적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허물어져 가는 철교를 가로질렀던 경험에 대해선 “영국에서 희귀 도서에 관한 경력을 쌓으려면 책 수집가와 딜러들이 사랑하는, 녹슨 철교를 헤매고 다녀야 한다”고 덧붙인다. 서점 직원으로서 겪는 좌충우돌 현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서점에 대한 독자의 환상을 부수기도 한다. ‘세월의 흐름에 흔들리는 법이 없는 곳’이란 인식을 향해 “서점은 원래 재정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로 정평 나 있다. 변화를 거부하는 서점은 역사의 흐름 속으로 사라지는 일이 일상다반사”라고 말한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