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후. 근처에서 아직 진료 중인 곳은 소아청소년과 병원이었다. 흔히 말하는 소아과. 진료과목에 내과와 이비인후과도 쓰여 있긴 했지만, 대기실에 가보니 어른들은 대부분 아기를 안은 엄마나 아빠였다. 이 나이에 술병으로 소아과를 찾은 게 머쓱해졌다.

호명에 진료실로 들어갔다. 반곱슬에 얼굴선이 둥근, 젊은 남자 원장님이었다.
“지난 주말에 술을 좀 마셨는데…위염같이 속이 심하게 쓰려요.”
“아이고, 술을 많이 드셨어요. 날짜는 좀 됐는데? 볼까요.”
다시 한번 내 말을 받는 의사와 눈이 마주쳤다. 안경 너머 눈에 빙글 웃음기를 머금고 있었다. 나도 조금 멋쩍게 웃었다. 기분 나쁜 민망함은 아니었다. 말썽 피운 어린이한테 ‘이그’ 가벼운 꾸지람 같은,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담긴.
얌전히 침상에 누웠다. 의사가 배 여기저기를 꾹 눌렀다.
“여기 아프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때요?” “아, 아파요.”
“위염 맞네요, 어휴 위가 딱딱하게 뭉쳐있어요. 많이 아프셨겠는데요.”
아래층 약국 역시 소아과의 어린이 손님들을 고려했는지 바구니에 뽀로로 사탕이 담겨있었다. 알록달록 사탕이 눈에 들어왔지만 차마 집지는 못했다.


‘기분이 몽글몽글하게 소아과가 친절했다’는 말에 동생이 얘기했다. 맞아, 그런 게 있었댔지. 어린이가 아닌 성인들이 일부러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 소아과를 찾았다고 했다. 접종 부위에 노란 바탕에 뽀로로 캐릭터가 그려진 밴드를 붙여주길 기대하면서. ‘비타민 사탕은 안 주나요?’ 한 발 나아간 질문에 ‘그건 울어야 줍니다ㅋㅋㅋㅋ’ 짖궂은 글도 있었다.
‘아무 데나 백신 있는 곳 가면 되지 참…’
지금은…. 몸져누울 정도가 아니고서야 약 털어 넣고 출근한다. 누구에게 아픈 티 내는 것도 민폐다. 위아래로 모실 부모님, 챙길 아이라도 있으면 내 몸 아픈 건 이제 나한테도 짐스러울 일이겠지.
그제 밤 아파트 현관에서 어떤 남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세살이나 됐을까, 눈이 땡그란 여자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나왔다.
“아빠!”
그야말로 돌고래 소리와 함께 아빠를 마중하는 얼굴이 정말이지 해사했다. 그렇게도 좋을까, 내 시선을 느꼈는지 아이가 나를 보고 싱긋 웃었다. 나도 웃어줬다. 이유 없이 모르는 누군가에게 웃을 수 있고, 그 미소가 돌아오는 시절.
다음에 또 아플 일이 있으면 그때도 못 이긴 척 소아과 병원에 가볼까. 주책인가 싶지만 슬그머니 궁리해본다.
[소소칼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소소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글입니다. 소박하고 다정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소실되지 않도록, 마음이 끌리는 작은 일을 기억하면서 기자들이 돌아가며 씁니다.
소소칼럼 >
구독 61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133
-

한규섭 칼럼
구독 4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26
-
- 좋아요
- 3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음식은 사랑을 싣고[소소칼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09/03/12682027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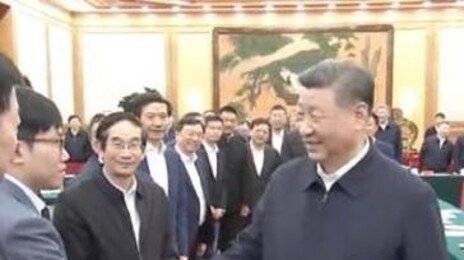
![[오늘과 내일/이정은]부정선거 의혹이 키운 혐중… 외교 부담만 커진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049864.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