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작가 아멜리 노통브 신작… 아버지가 직접 겪은 사건서 영감
인질 협상 중 총구 앞에 선 남자… 불현듯 선명해지는 생의 감각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지는 삶… 프랑스 ‘르노도 문학상’ 수상
◇첫 번째 피/아멜리 노통브 지음·이상해 옮김/208쪽·1만3800원·열린책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사형장의 한 장면에서 시작해 ‘살아있음’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아멜리 노통브의 신작이 번역 출간됐다. 벨기에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그는 이 작품으로 프랑스 4대 문학상인 ‘르노도(Renaudot)’상을 거머쥐었다. 그가 스물다섯 살인 1992년 발표한 첫 소설 ‘살인자의 건강법’은 단번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2015년엔 문학적 공로를 인정받아 벨기에 왕실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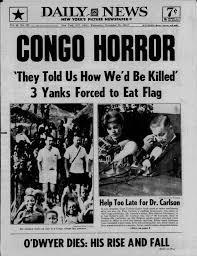
200쪽 내외로 길지 않은 신간은 담담한 문체로 후반부까지 속도감 있게 흘러간다. 한 사람의 일대기나 회고록을 빠르게 훑는 느낌이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남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갈구하던 주인공 파트릭. 아버지 부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강해지려고 노력한 유년기부터 첫 연애를 시작한 학창 시절, 결혼, 외교관 입문 등의 이야기가 유쾌하게 펼쳐진다. 인질극 외에 극적인 사건은 없지만 작은 에피소드들이 촘촘히 모여 작가가 그린 아버지의 모습이 완성된다.
다만, 실제 사건이던 인질극 외에 소설 속 어느 대목이 노통브 아버지의 실제 모습이고, 어느 부분이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사실과 허구를 가로지르는 문장들 속에서 독자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생에 대한 집착’을 되새기게 된다.
책의 마지막에선 처음의 사형장 장면이 다시 등장한다. 그를 향해 총탄이 발사되려던 순간, 그와 협상하며 많은 대화를 주고받은 반군 지도자가 나타나 “집행 중단”을 외친다. 파트릭은 “나는 살아있고,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얼마나? 2분, 2시간, 50년? 그건 중요하지 않다”며 삶에 대한 열망과 쾌감을 고백한다. 기승전결의 뚜렷한 줄거리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다소 밋밋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버지의 삶을 반추하는 거장의 묵직한 문장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의 존엄과 아름다움을 깊이 있게 전달한다.
책의 향기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게임 인더스트리
구독
-

글로벌 포커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밑줄 긋기]굳세고 다정하고 가능한 한 많이 웃으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2/13/130637816.4.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