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그가 내일이면 퇴직 연차에 접어든다. 곧 환갑을 맞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근미래인 걸 알면서도 영원히 당도하지 않을 것처럼 가족 모두가 멀찍이서 더듬어 보기만 했던 당신의 조용한 졸업이 어느새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었다.
지금이야 몸담은 조직의 책임자이고, 집안의 여러 대소사도 능수능란하게 처리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빠에게도 참 서툴고 우스웠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 어린 시절 하루는 앞집 사는 은진이와 같이 유치원에 가는 길에 은진이네 아주머니가 엄마한테 하시는 말씀을 엿들었다. “자기네 남편, 어제 왜 계단에서 잤어?” 반복되는 남편의 늦은 귀가가 불만스러웠던 엄마는, 도어락이 없던 시절 문을 꽁꽁 잠그고 냅다 자버릴 정도로 화끈한 아내였다.
그러나 그 젊은 시절 중 무엇보다 우스웠던 대목은 그의 ‘아빠 노릇’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빠는 밑도 끝도 없이 성실한 다정함으로 어려서부터 기질이 순하지 못하고 예민했던 딸의 속을 자주 뒤집어놓았다.
사춘기에 접어든 여자아이들이 으레 그렇듯 나도 커가며 아빠가 어색해졌다. 그땐 왜 그렇게 집안의 남자들이 싫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느새 브래지어가 필요해졌다는 사실을 남동생은 물론 아빠도 몰랐으면 했다.
그런데 당시 ‘가정적인 가장’을 표방하는 젊은 딸 아빠들 사이에 이상한 유행이 돌았던 모양이다. 딸의 첫 ‘브라자’는 아버지가 사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빠는 사려 깊게도 당장 입을 스포츠 브라 한 장과 미래를 대비한 와이어 브라 한 장씩을 내게 선물했다. 그것도 온 가족이 함께 떠난 첫 해외 여행지인 오키나와에서, 여행 가이드로 나서 준 아빠의 친구에게 ‘왜 백화점 여성 속옷 코너에 꼭 들러야 하는지’ 설명해 가며…. 그렇다. 내 인생 첫 브라자는 일제다.
그러나 나의 미치도록 가정적인 아버지는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날따라 시간이 남았던 재석이 삼촌이 초대에 응했다. 아빠의 고향 친구인 삼촌은 곧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다. 그때도 지금도 싱글이신, 그저 친구네서 술 한잔하고 싶었던 재석이 삼촌이 들뜬 친구와 표정이 썩어가는 그의 딸 사이에 앉아 영문 모를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생리 축하합니다…. 생리 축하합니다…….” 그날 케이크를 가장 맛있게 먹은 사람은 남동생이었다.
딸의 변화를 알아챈 엄마는 어느 날 ‘매일 저녁 식사 뒤 아빠와 딸 손잡고 30분 데이트’ 룰을 만들었다. 아빤 아마 ‘입꾹닫’ 상태인 딸과의 30분보다야 차라리 끝없는 술 시중이 낫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이 처방에 별다른 효험이 없자 엄마는 우리에게 매일 출근-등굣길 버스 정류장까지 25분 거리도 손을 맞잡고 걷게 했다. ‘오은영 이전’의 시대는 이토록 엄혹했다.
1년 정도를 그렇게 다녔는데 딱 하루가 기억난다. 지금처럼 추운 겨울날이었다. 하도 바람이 매섭고 손가락이 시려 나도 모르게 잡고 있던 손을 잠시 풀고, 마치 ‘보리 보리 쌀’ 게임에서 잡힌 주먹의 모양처럼 당신의 손아귀 안에 내 주먹을 넣었다. 그러자 아빠가 “아이고, 지 엄마 연애 때랑 똑같네” 그랬다. 지금은 당신도 잊은 그 순간이 왜 여태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가끔 그 시절 얘기가 나오면 아빠는 “나 그때 너한테 상처 많이 받았다” 하시며 웃는다. 내게는 그 1년이 ‘보리 보리 쌀’로 요약되니, 엄마의 처방은 그래도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 그렇게도 다정해질 기미가 없던 부녀지간은 시간이 흘러 술상 앞에 마주 앉아지자 싱겁게 풀렸다. 잘 익은 화해이자 애틋한 조우였다.
어린 딸의 시린 주먹을 손에 꼭 쥐고 일터로 나서던 당신은 이제 어딜 향해 걷게 될까. 이미 몇 년 전부터 은퇴 후를 부지런히 설계해 왔던 당신이기에 그리 걱정이 되진 않는다. 그러나 가끔 당신이 초행길을 헤매느라 고단해진 날이면, 언제고 그날의 소주는 내가 사겠다.
[소소칼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소소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글입니다. 소박하고 다정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소실되지 않도록, 마음이 끌리는 작은 일을 기억하면서 기자들이 돌아가며 씁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다시, 당신의 시작[소소칼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2/31/13075892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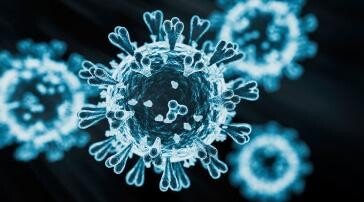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