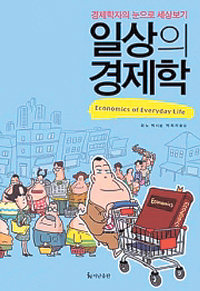
승승장구하다가 마지막 문제를 틀려 승리의 트로피를 놓치는 참가자. 그는 왜 적당한 선의 상금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로 도전을 감행해 무릎을 꿇고 마는 선택을 한 것일까.
독일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의 경제 전문 에디터 하노 벡 박사는 ‘일상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TV 퀴즈쇼는 확률상 불리한 비즈니스”라고 정의한다.
그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자.
“거리에서 옷을 잘 차려입은 남자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왔다고 상상해 보자. 2만5000유로를 걸고 남자가 낸 사지선다형의 문제를 풀면 되는데, 만약 당신이 정답을 맞히면 2만5000유로를 받고, 틀리면 2만5000유로를 남자에게 줘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제안을 받으면 ‘내가 왜 그런 내기를 해야 하죠?’라며 어이없어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당장 TV를 켜 봐라. 퀴즈쇼에서는 이런 내기가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벡 박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의 퀴즈쇼를 가정한다.
베팅액(그동안 게임에서 벌어놓은 돈)은 2만5000유로이고, 새 퀴즈에 할당된 상금 역시 2만5000유로다. 그리고 참가자가 문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참가자가 이길 확률은 25%다. 즉 4개의 예문 가운데 아무거나 한 개를 찍었을 때 정답을 맞힐 확률이다.
계산해 보면 참가자의 기댓값은 2만5000유로의 25%인 6250유로가 된다. 이는 베팅 금액인 2만5000유로보다 적은 액수이며, 따라서 참가자에게는 아주 불리한 비즈니스다.
그럼에도 선뜻 베팅에 응한다. 왜 그럴까? 퀴즈쇼 참가자들은 자신이 확보한 상금을 직접 만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통 큰 베팅이 가능해진다.
이에 반해 ‘거리에서 제안한 베팅’에서는 “베팅에 걸 돈을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꺼내야 하기 때문에 베팅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식 투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증권과 종이돈을 똑같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집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집 한 채가 가장 큰 자산인 한국 사회에서 직접 만져 보지 않은(현금화하지 않은) 집값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퀴즈쇼와 비슷한 심리로 은행돈도 과감하게 빌려 쓰지 않을까.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X스포츠 >
-

사설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X스포츠]"짜증은 가라" 다운힐 즐기는 인라인 스케이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0/04/27/6790782.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