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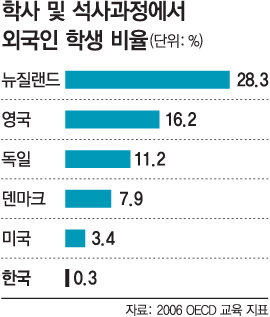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대 나노테크놀로지 연구소 ‘크랜’의 연구원은 140여 명이다. 하지만 이들의 국적은 30여 개다. 2003년 설립된 크랜이 4년 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핵심 인재들을 스카우트해 온 결과다. 이들 대부분은 박사학위 소지자. 스카우트 비용은 대학이 아닌 아일랜드 산업고용부 산하 과학연구진흥재단이 댔다.
미국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한 전병선(36) 박사도 이곳으로 스카우트된 인재 중 한 명. 그는 “미국에서도 제안이 있었지만 크랜이 연봉을 2배 주고 실험 장비를 원하는 대로 구입해 주겠다고 한 것에 끌렸다”고 말했다.
○ 인재 모아 놓으면 기업도 따라와
크랜의 피터 니르말라즈(25) 연구원이 하는 탄소나노튜브 관련 연구는 미국의 컴퓨터 기업 HP가 지원한다. 휘어지는 노트북 화면을 개발 중인 HP에 이 기술은 꼭 확보해야 할 대상이다. 니르말라즈 씨는 “인도인인 내가, 아일랜드 대학에서, 미국 기업을 위해 일한다”고 말했다.
과학연구진흥재단 매티 매케이브 공보관은 “핵심 인재를 모아 놓으면 기업도 저절로 따라온다. 이것이 우리의 ‘브레인 투 비즈니스(Brain to Business)’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필요한 인재가 나라 안에 없으면 외국에서라도 데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학장이나 연구소 소장이 외국인인 경우도 흔하다.
덴마크 올보르대의 통신연구소 ‘CTIF’ 최고책임자는 인도인인 람지 프라사드 교수다. 프라사드 교수 아래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박사과정 학생 150여 명이 통신 분야 첨단기술을 연구 중이다. 삼성전자가 투자한 4세대 이동통신 프로젝트 ‘제이드(JADE)’를 요모 히로유키 씨를 비롯한 연구원 4명이 수행 중이기도 하다.
○ 현장 배워라, 학점 줄게
한국의 대학처럼 주입식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대학은 선진국에서 찾기 힘들다.
아일랜드 더블린공대(DIT)는 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온 기간에 대해 1년까지 필요 학점 전부를 인정한다. 학점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기업 인턴십에 참여하라는 뜻이다.
지난해 이 학교에서 1년 동안 공부한 이민지(연세대 경영학과 4년·여) 씨는 “3학년이 되면 회사로 나가는 분위기”라며 “경영학의 경우 세부전공 개수가 한국의 2배일 정도로 상세해서 기업과의 연결도 쉽다”고 말했다.
기업과 연계된 실전 지식 전수는 기본. 1999년 설립된 덴마크 코펜하겐 IT대학은 컴퓨터 게임 디자인, 컴퓨터 게임 이론, 게임 문화를 정식 과목으로 가르친다. 이 대학 5층에는 정보기술(IT) 벤처기업 50여 개가 입주해 있다. 학제 간 연구와 현장 교육 때문이다.
지난해 교환학생으로 덴마크 왕립코펜하겐대에서 공부한 이자연(연세대 사회복지학과 3년·여) 씨는 한 학기에 2, 3과목만 들었다. 한 학기에 6, 7과목을 수강하는 한국보다 과목 수는 줄었지만 공부 양은 더 많았다.
이 씨는 “한국의 비정규직 정책을 주제로 소논문을 쓰면서 관련 서적을 10권 읽고 각종 연구소를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단순한 암기로는 얻을 수 없는 깊이 있는 지식을 얻었다”고 말했다.
○ 초등학교부터 교육혁신
시드니창 >
-

횡설수설
구독
-

법조 Zoom In :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구독
-

교양의 재발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시드니창]남북 한목소리 "계순희 파이팅"](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