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산업 경기호전에도 불황 탈출 신호 안보여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진 지 1년여가 지난 현재, 대부분의 산업은 이미 위기를 극복했거나 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조선 및 해운업은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코스피는 올 들어 40% 가량 상승했지만 국내 주요 조선 해운업체들의 주가는 연초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에서 허덕이고 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두 산업은 초호황이었다. 당시 조선업계에는 '몇 년 동안의 일감이 쌓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해운업계 역시 '모든 선박을 총동원해도 전 세계 교역량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기였다.
두 산업의 침체는 물론 글로벌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지만, 수년 간의 호황에 따른 반작용의 성격도 짙다. 앞으로 실물경기가 살아나더라도 조선 해운 산업이 정상화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뜻이다.
●조선-해운의 동시다발적 침체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의 선박 발주량은 1500만GT('총 톤수'를 뜻하는 조선업계 계측단위)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3~2008년 조선업 호황기에 연평균 1억GT가 발주된 것에 비하면 7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컨테이너선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HR용선지수도 지난해 4월 1361에서 지난달 334까지 떨어졌다. 조선사들은 새로운 일감이 없고 해운사들도 수입이 뚝 끊긴 것이다.
침체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로 교역량이 줄면서 해상 운임과 선박 가격이 폭락했다. 컨테이너선 등 배 값은 호황기 고점 대비 30~40% 가량 떨어졌다.
배값 하락은 선박금융시장에 고스란히 충격을 줬다. 보통 해운선사들은 배를 조선사에 주문하면서 배 값의 상당부분을 금융사에서 빌리는데, 이 때 담보가 되는 선박 가격이 떨어지자 금융사들이 해운사에 대한 대출을 중단했다. 자금난에 빠진 해운선사들은 그동안 조선사에 발주해놓은 선박을 취소하거나 인도 지연을 요구했다. 두 산업 간에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 전문가들은 당분간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더라도 두 산업이 정상화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호황기에 만들기 시작한 배가 너무 많아 고질적인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의 선박량(12억1000억t)의 50%에 이르는 5억9000만t이 지금도 추가로 건조되고 있다. 윤필중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호황기 때 발주된 배가 너무 많은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만약 이 배들이 (발주취소나 지연 없이) 모두 건조, 인도된다면 많은 조선 해운사들이 공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급과잉 해결 없이는 불황 계속될 듯
가시적인 위기는 글로벌 해운사들로부터 시작됐다. 올 9월 세계 3위 컨테이너 선사인 프랑스의 CMA-CGM이 모라토리엄 위기에 처한 데 이어 최근에는 대만 해운사 TMT도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전세계 주요 해운사들의 돈 줄이 말랐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사들도 올 들어 줄줄이 영업적자를 냈고 3분기에도 대규모 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조선업계는 아직 꾸준한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이는 호황기에 미리 받아놓은 일감이 계산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조선사들도 올해 들어 신규 선박 수주가 거의 끊겨버린 것을 감안하면 2011~2012년쯤이면 극심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증권업계에선 조선 해운 업계의 불황이 최소 1,2년은 더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조인갑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경기 사이클 상으로는 2010년 하반기나 돼야 겨우 살아날 수 있지만 업계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2011년까지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며 "조선업체들의 경우 플랜트나 건설장비 등 비(非)조선 분야 사업을 확장하는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재학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물동량이 줄어든 것보다 해운 시장에 배가 너무 많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산업이 살아나지 못 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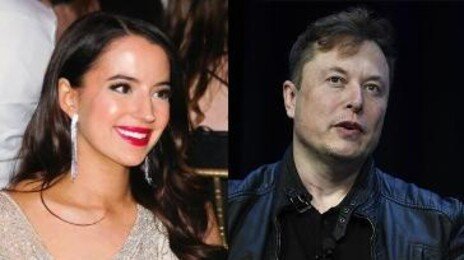

![화성 가려고 그린란드 산다?…머스크-트럼프의 ‘꿈’[트럼피디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037250.1.thumb.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