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에 대한 집단저항 줄이는 방법은
이노베이션 킬러/신시아 바튼 레이브 지음·이재경 옮김/312쪽·1만4000원·옥당

몇 해 전부터 기업들이 창조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2006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40여 일간의 해외 출장에서 창조경영을 강조한 이래 창조경영을 선언하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창조경영을 선언하는 기업이 나온다.
왜 창조경영일까. 기업들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투자를 할 만한 새로운 분야를 찾기가 쉽지 않다. 5년 후, 10년 후가 걱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혁신을 “기존의 자원이 부(富)를 창출하도록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창조경영을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창출하는 토양을 마련하는 경영방식이라고 본다면 혁신과 창조경영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의 기회는 바로 새로운 사업의 기회인 것이다.

이 두 가지 성향 때문에 인간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짓밟히고 비약적 타개책은 묵살된다. 혁신은 물위로 드러내지도 못한 채 익사하고 마는 것이다.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조직 내에서는 이 행태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단언한다. 저자는 인간이 혁신에 불리한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그래서 저자가 생각해낸 해법이 무중력사고자 개념이다. 조직의 일원이 아니면서도 조직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무중력사고자들이 바로 혁신을 가로막는 집단사고와 전문가사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경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을 도와줄 무중력사고자를 찾아 함께 일하는 방법까지 보여준다. 혁신전략의 전문가답게 구체적이다.
그러나 혁신이라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한때 혁신의 성공사례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던 두바이는 혁신에 따르는 리스크가 어떤 것인지 일깨워준다. 이 책이 혁신에 동반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까지 담았다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박영균 논설위원 parkyk@donga.com
▼애플發 ‘앱 이코노미’ 잔치 열렸다▼

음식을 시킬 때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장 가까운 음식점을 찾는다. 위기 상황에는 ‘병원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의 약자인 앱스토어(App Store) 전성시대다.
한국 모바일 산업이 아이폰과 앱스토어에 뒤진 이유를 소프트웨어의 취약성에서 찾고, 계속 이어지는 애플의 변신 과정을 알아봤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철저함과 디자인 장인정신, 내부 혁신 문화 등 애플의 성공 요인도 7가지로 정리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JP모간, 금융위기 어떻게 넘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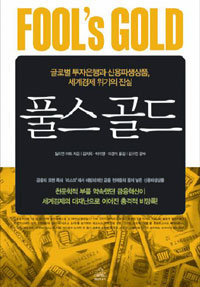
세계적인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의 스타 기자인 저자가 2008년 지구촌을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탄생과 종말을 그린 책이다.
JP모간체이스의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과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을 비롯한 금융계 핵심 인물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신용파생상품의 시작부터 금융시스템 붕괴까지를 다큐멘터리처럼 다뤘다.
이야기는 1994년 JP모간의 스와프 팀이 한 고급호텔에서 연 광란의 파티에서 시작된다. 은행들의 오랜 족쇄인 ‘위험’에서 은행을 해방시켜 주는 신용파생상품이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이곳에서 싹을 틔운 것이다. 이후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며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던 이 같은 금융상품들은 유례없는 저금리 속에서 주택경기와 결합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괴물’을 창조했지만 베어스턴스, 메릴린치, 리먼브러더스 등이 줄줄이 쓰러지는 동안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리더십과 조직문화 덕택에 살아남은 JP모간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박영균 논설위원의 추천! 이번주의 책]자본의 전략 外](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0/07/09/29772994.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