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법적 규제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움직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차이가 있다면 이를 먼저 제기한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의 상표권 소유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정도다. 뒤늦게 뛰어들어 체면을 구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항변하고 있다.
법적 강제를 통해서라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전세난의 불길이 잡힌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하지만 법으로 내리누른다고 주기적으로 뜀박질하는 전세금이 숨을 고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1981년 제정해 몇 차례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작 필요할 때는 오히려 전세금 급등을 부채질했던 역사적 사실이 이 우울한 진단을 뒷받침한다. 여야가 이중창으로 화음을 맞추는 법적 규제 말고도 그동안 전세금의 고삐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 때가 많았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말기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택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웠다. 2017년까지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 채를 짓겠다고 했다. 전세금이 치솟을 때 이 임대주택을 분양해 공급을 늘리면 전세시장을 조기에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중대형 아파트도 포함시켜 중산층 세입자를 끌어들이려고 했다. 임대주택을 짓는 데 드는 재원은 90조 원이 넘는 임대주택펀드를 만들어 충당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자가 보유 확대로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주창했던 ‘오너십 사회(Ownership Society)’와 비슷한 흐름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 “중산층한테까지 국가가 임대주택을 지어주어야 하느냐”라고 했던 한나라당도 거들었다. 주택을 싸게 짓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시작했다. 보금자리지구에는 임대 및 분양주택이 함께 들어서지만 수요자들의 관심은 시세보다 싼 분양아파트에 쏠렸다.
그 결과 2007년에 14만 채 넘게 공급됐던 임대주택은 2008년에는 11만 채로, 2009년에는 9만 채, 지난해는 7만 채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설상가상 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주택시장의 흐름이 크게 바뀌었다. 대형보다는 소형을, 내 집 소유보다는 세살이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매매 수요를 억눌러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제 정부의 주택정책이 코페르니쿠스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한다는, 관점의 일대 변화를 말한다. 이를 현재 상황에 빗대 말한다면 투기 억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는 주택임대차시장을 키우고 관리하는 정책에 비중을 두는 식이다. 이상을 앞세워 시장에 발을 딛지 않거나 시장이 가는 방향과 다른 정책은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은 특정 정부나 정당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시장 친화적이되 시장의 빈틈을 보완해 나가는 주택정책이 요구되는 때다.
데스크 시각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여행스케치
구독 6
-

서영아의 100세 카페
구독
-

유재영의 전국깐부자랑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데스크 시각]‘무한 도전’ 출발은 ‘무한 책임’의 리더십](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1/03/27/3593073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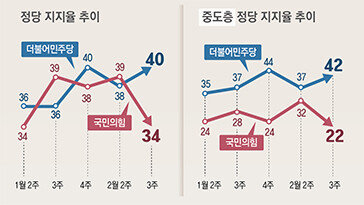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