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2일 다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작년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원래대로 되돌렸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고 민간 택지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했다.
언뜻 보아도 이번 대책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수요와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 한편 주택 거래는 늘리고 싶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주택 거래가 상당 부분 가격 상승 기대와 대출 증가를 통해 이뤄진다고 보면 결국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싶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듯하다.
하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 가는 정책인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가계의 자산 중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으며 은행 대출의 66%가 주택담보대출이다. 반면 자가주택비율은 서울의 경우 50%에도 못 미친다. 전국적으로 봐도 55%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으로 가계 대출 안정, 주택 거래 활성화,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쉽지 않다. 무엇보다 DTI 규제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 8·29 대책 이후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중 DTI 규제 완화로 인한 부분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대출을 결정짓는 것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와 실질금리이지 DTI 규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취득세를 깎아줘도 거래는 늘어나기 어렵다. 가계 대출 규모가 크다는 것은 이미 대출을 받아 집을 살 만한 사람들은 집을 샀다는 얘기고, 그 과정에서 가격이 높아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계는 자기 돈을 많이 들여야만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책은 어정쩡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장기적 차원의 원칙을 세우고 정상적 통화·재정정책을 사용해 부동산에 대한 가계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이유다.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돼 온 부동산 의존적 경제 체질로 인한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다.
최석원 삼성증권 채권분석팀장
마켓투데이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어린이 책
구독 14
-

사설
구독 787
-

소소칼럼
구독 63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마켓 투데이]주가 상승기엔 ‘성장형 펀드’… 주가 하락기엔 ‘가치-배당형’](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1/03/25/3589536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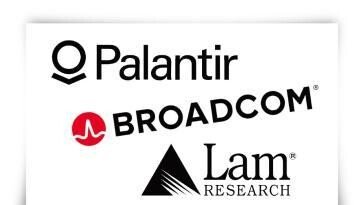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