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입법… 1000억 무슨 돈으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피해자까지 구제해주는 특별법을 의결하자 전 금융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에서 정한 보장한도를 어기고 정치적 판단으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져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지적이 나온다.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의 5개 금융단체는 10일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이 법이 통과되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며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돈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영업이 중단된 16개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15조 원을 투입했다. 이 재원은 시중은행에서 9조3000억 원을 차입하고 예보채권 3조6000억 원어치를 발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충당했다.
금융회사가 예보에 내는 예금 보험료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고객의 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인데 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법에서 정한 구조조정 용도가 아닌 저축은행 예금자나 투자자들의 손해를 메우는 데 쓰는 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퓰리즘에 빠져 표 확보에만 나선다면 제2, 3의 저축은행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최악의 무서운 선례를 남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원칙이 깨져 국민들이 최악의 경우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를 갖게 되는 점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외환위기 때 일시적으로 예금액을 모두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2002년 1월부터 5000만 원 한도를 둔 현 체계로 개편됐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법에 규정한 보장한도와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원칙이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것이다. 이처럼 한번 기준이 허물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때마다 정치적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별법 때문에 여전히 부실이 남아 있는 저축은행과 상호신용회사 등 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정체될 수도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저축은행을 포함한 4개 저축은행의 재무상태와 자구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상반기에 경영개선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피해까지 보상하기 시작하면 저축은행 추가 퇴출 시 다시 예외적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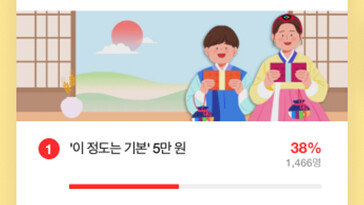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