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최모 씨(30)는 올 4월 메리츠종금증권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5000만 원을 넣었다. 가입 당시 이 증권사 직원은 “연이율 3.4∼4.4%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괜찮은 변동금리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지난달 최 씨는 이 회사로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CMA 금리가 전체적으로 0.25%포인트씩 낮아졌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미 넣은 5000만 원엔 기존 금리가 적용되지만 추가로 입금되는 금액에는 낮춰진 금리가 적용된다는 설명이었다. 최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이달 10일 다시 문자메시지가 왔다. “예치 후 1년 뒤 적용되던 4.4%의 연이율을 3.9%로 내린다”는 내용이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날 하루 뒤였다. 최 씨는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이율을 낮추고, 동결돼도 이율을 낮춘다는데 너무 금융회사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일을 처리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나은행의 대표 예금상품인 ‘하나 e-플러스 정기예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3년 만기에 4.2%의 이자를 줬다. 하지만 이 상품은 6월 7일 금리가 4.0%로 처음 낮아진 뒤 7월 3일 3.9%, 지난달 한은의 금리인하 다음 날인 13일 3.7%, 17일 3.6%, 27일 3.4% 등으로 예금금리가 한 달 새 0.5%포인트나 떨어졌다. 같은 7월에 같은 예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가입 시점에 따라 0.5%포인트나 차이 나는 금리를 적용받는 셈이다. 다른 은행 예금상품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특히 예금금리는 한 달에 여러 차례 낮아지는 동안 대출 금리는 요지부동이다.
금리변동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시장상황에 따른 금리변동의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금리 움직임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이용하는 금융회사들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 이쯤 되면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고 말한 것처럼 “금리가 묘하다”는 말도 나올 만하다.
경제 카페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송평인 칼럼
구독
-

맛있는 중고 이야기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경제 카페]밀-콩 국제가격 27∼39% 뛰는데 내년 밀 생산 증대가 정부대책?](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2/08/20/4875635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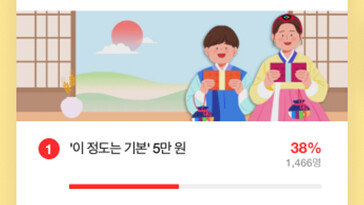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