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만에 모든 약속이 사라졌다. KT는 지난해 7월 말 ‘페어 프라이스’라는 제도를 시작했다. 휴대전화 값이 날마다 달라지고, 같은 날에도 매장마다 들쑥날쑥 종잡을 수 없는 가격 탓에 제값 주고 휴대전화를 산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었다. SK텔레콤도 곧이어 ‘가격표시제’라는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고, LG유플러스 역시 올해 초부터 이에 동참했다.
하지만 11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은 휴대전화 유통 매장의 풍경은 의욕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던 때와는 전혀 달랐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서는 “‘페어 프라이스’요?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조금 많이 줄 때 사시면 이익”이라며 번호이동을 권했다.
○ 보조금 전쟁에 약속 헌신짝
취재팀이 돌아본 서울시내 10여 개 휴대전화 매장 가운데 가격표시제를 지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판매원들은 ‘공짜’를 강조하며 고객을 모았고, 동일한 제품의 가격도 매장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일부 매장은 신용카드나 모바일카드 가입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홍보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매장에서는 “판매점과 대리점 사이에도 가격차가 많이 난다”고 말할 정도였다.
물론 제품 옆에 ‘68만 원’ ‘79만 원’과 같이 가격을 적어놓은 매장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상 눈속임이었다.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매일 대리점이나 영업본부에서 내려온다는 별도의 가격표를 A4용지에 출력해 두고는 이를 토대로 판매가격을 알려줬다.
○ 과열 경쟁으로 전산망도 다운
통신사가 쓰는 천문학적인 보조금 때문에 널뛰는 유통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5월 도입된 ‘블랙리스트 제도’도 유명무실해졌다. 이 제도는 휴대전화를 통신사 대리점 대신에 대형마트나 가전제품 매장에서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국내 제조사들은 이 제도가 시행된 뒤 기기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목적으로 ‘갤럭시M 스타일’(삼성전자), ‘옵티머스L7’(LG전자) 등 값싼 보급형 스마트폰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현재 시장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종로의 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은 “신용카드에 가입하면 갤럭시M을 무료로 주고 포인트로 스마트폰 값을 갚아나갈 수 있다”며 “갤럭시M을 사고 싶으면 통신사나 가전매장 대신에 카드사를 찾으라”고 말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도 “솔직히 이런 블랙리스트용 휴대전화는 통신사들이 엄청난 보조금을 뿌리는 자체 유통 휴대전화보다 비싸 판매량을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안 팔린다”고 털어놓았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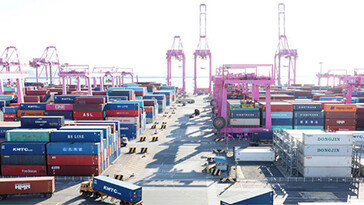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