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病’ 치유 중심엔 ‘악탈’ 있었다

‘두 명의 네덜란드 사람이 길을 걷다 땅에 떨어진 1센트짜리 구리 동전을 발견했다. 서로 갖겠다고 우기며 양쪽 끝을 잡아 당겼다. 그러다 그만 동전이 길게 늘어나 구리선이 되고 말았다.’
이런 유머가 있을 정도로 이해타산에 밝은 네덜란드인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년 넘게 ‘행정규제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왜일까.
15일 네덜란드 행정도시인 헤이그를 방문해 규제개혁 현장을 돌아봤다. ‘규제 부담을 줄여 기업과 전문가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도록 하면 결국 고용과 세수(稅收)가 늘어나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그들의 강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 규제개혁기구인 ‘악탈(ACTAL)’은 국회의사당과 행정부처가 모인 헤이그의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다. 작은 건물의 두 개 층을 빌려 쓰고 있는 악탈은 3명의 위원과 12명의 스태프로 이뤄진 ‘초미니’ 기관이었다. 이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할까 싶었다. 하지만 악탈이 네덜란드 규제개혁에서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네덜란드는 1970년대 이른바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으로 경제가 휘청거렸다. 자원개발에 따른 경제 발전이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낳아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독이 된 것이다. 네덜란드는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각종 노동규제를 완화하고 카르텔을 푸는 개혁을 추진했다. 발전(發電)업, 운송업, 통신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렸다.
이에 힘입어 네덜란드의 서비스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4%, 고용의 81%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네덜란드는 스위스, 영국 등을 제치고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외국인직접투자(FDI) 환경이 좋은 나라로 평가된다.
○ 규제 심사 대상 확대
악탈은 규제 법안이 상정되면 ‘이 규제가 정말로 없으면 안 되는 것인지’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한다. 행정부담을 측정할 때는 수치화한 표준 모델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규제 부담이 작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찾아내고, 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부처에 묻는다.
검토 과정에서 규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비율은 30∼35%에 그친다. 10∼20% 정도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로 거부 또는 대폭 수정된다. 악탈의 얀 텐 후펜 위원장은 “행정부처가 우리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가 입법 과정에서 악탈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대부분 반영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악탈은 과거 주로 기업 대상 규제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의료, 교육, 공공 안전, 복지 등의 규제 완화로 영역을 확대했다.
산업구조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한다. 노동자와 고용주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에 따라 규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최근의 화두다. 개인이 풍차 등 발전시설을 이용해 만든 전기를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규제 부담을 25% 감축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악탈은 2016년까지 25억 유로의 규제 부담 감축을 새로운 목표로 세웠다.
○ 서비스산업 규제 발목 풀어야
전문가들은 높은 규제 장벽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서비스산업의 연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기회가 열렸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대형 병원과 요지의 호텔 신축이 제한되는 등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폐지는커녕 신설되는 규제도 많다. 한국규제학회는 19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규제 법안 101건 가운데 29건이 필요성이 낮거나 효과가 낮고 수단이 적절치 않다고 분석했다. 김태윤 한국규제학회장(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은 “힘 센 이해단체의 입김을 받거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빠져 규제를 만들다 보니 산업의 발전은 없고 이해집단의 갈등만 양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헤이그=김용석 기자 nex@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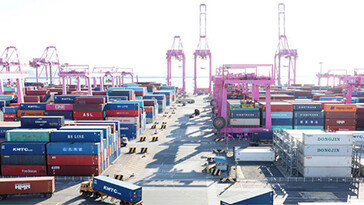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