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 주얼리 박람회 ‘바젤월드’
45개국 1815개 브랜드 참가 성황… 고가 브랜드홀 북적 중저가는 한산
○ ‘완전히 달라졌다’
올해 바젤월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4억5400만 달러(약 5400억 원)를 들여 외관을 손봤고 전통적으로 큰 변화가 없던 부스의 위치도 흔들었다.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럭셔리 업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처럼 부스가 화려해진 것은 불황과 연관이 있다. 제니스의 아시아퍼시픽 디렉터 유고 에스큐드 씨는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들은 불황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예전만큼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 건 사실”이라며 “브랜드의 진정성과 히스토리를 얼마나 강조하느냐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시계로 명성을 쌓아온 브라이틀링이 조난당했을 때 구조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이머전시’ 새 모델을 내놓은 것을 비롯해 각 브랜드의 정체성과 스토리가 뒷받침되는 신제품들이 주를 이룬 것은 이 때문이다. 불황으로 인한 시계 산업의 양극화는 현장에서도 뚜렷이 감지됐다. 고가 브랜드들이 모인 메인홀과 달리 상대적으로 중저가 캐주얼 라인이 몰린 다른 홀들은 눈에 띄게 한산했다.
○ 아시아 시장을 잡아라
아시아 특유의 예물 문화를 겨냥해 금장으로 장식된 신형 페어 시계를 선보인 태그호이어처럼 ‘페어 라인’을 강화한 브랜드가 많아졌다. 다이얼(시계판)의 크기가 계속 작아지는 것도 처음 고급 시계를 선택하는 아시아인들이 크고 튀는 제품보다 체형에 맞는 작은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위블로와 제니스는 다이얼 크기를 2mm 이상 줄인 제품을 새로 선보였다.
한국 시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간 제트기를 보유한 브라이틀링은 올해 한국과 스위스 수교 5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5일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과 함께 한국에서 처음으로 에어쇼를 펼친다. 브라이틀링 장 폴 지라댕 부회장은 “한국은 아시아 시장의 전략 거점으로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바젤=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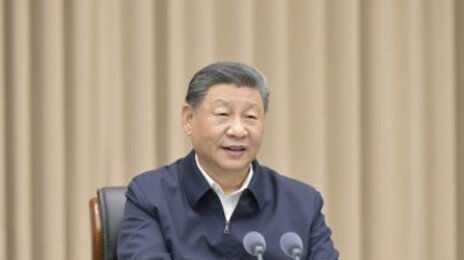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