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의 아버지’ 팀 버너스리 방한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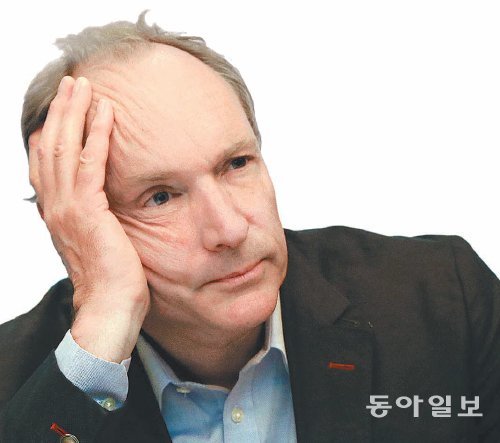
인터넷은 196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와 스탠퍼드대연구소(SRI) 사이의 컴퓨터 2대가 구리선으로 연결되면서 탄생했다. 하지만 1989년까지 20년 동안 인터넷은 대학과 연구소의 소수 연구자들 사이에 설치된 ‘조금 발전된 전보(電報)’ 수준에 불과했다.
오늘날 쓰이는 인터넷은 1989년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연구원으로 일하던 팀 버너스리에 의해 발명됐다. 그는 세계 각국의 웹페이지가 동일한 표준으로 정보를 전송하며 서로를 연결해 마우스 클릭만으로 세계 각국을 탐색할 수 있는 ‘월드와이드웹(WWW)’을 만들어 ‘WWW의 아버지’로 불린다.
버너스리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WW Consortium·W3C) 이사는 1일 열린 인터뷰에서 “발전된 인터넷 경험을 가진 한국인들이 웹을 발전시켜 나가는 W3C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W3C는 서로 다른 국가 사이에 인터넷을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표준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버너스리가 1994년 CERN에서 나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설립했다. 그는 2일 SBS가 주최하는 서울디지털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아 ‘협력의 목적’이란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다.
그는 “웹에는 국경이 없고, 국경을 넘는 협력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이나 중국처럼 독특한 문자를 쓰고 서구 국가들과 다른 인터넷 정책과 독특한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검열 규제를 따르지 않는다며 구글 검색 서비스를 차단했고, 한국은 한국에서만 쓰는 공인인증서 제도 같은 독특한 전자 금융거래 방식을 쓴다.
버너스리 이사는 이런 것을 “전형적인 ‘NIH(여기서 만든 게 아니다·Not Invented Here) 신드롬’”이라고 지적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제품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만든 인터넷 기술보다 더 좋은 기술을 만들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지만 인터넷이야말로 NIH 신드롬을 극복한 덕분에 오늘날의 놀라운 결과를 만든 기술”이라며 “나도 유럽 출신이지만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과 연결되고 싶어 WWW를 만들었다”고 했다.
○ 웹의 부작용을 넘어서자
인터넷을 통해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폭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개념 자체가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너스리 이사는 “사생활이란 지금까지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지켜야 하는 개인정보로 받아들여졌다”며 “하지만 웹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이런 개인정보는 불행히도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우리는 G마켓이나 11번가 같은 쇼핑사이트에 정보를 남기고, 스마트폰으로 달리기 기록을 저장하면서, 건강사이트에 생활패턴을 남긴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찬 나이키의 ‘퓨얼밴드’라는 운동기록용 전자기기를 보여주며 “이 회사가 이런 정보를 가져가지만 사실 그 덕분에 나는 내 운동기록을 보고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다”며 “문제는 이 정보를 잘못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너스리 이사는 “나도 MIT에서 연구원을 뽑을 때 면접을 하면서 그들의 성별과 나이를 알게 되지만 성별과 나이는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를 뺀 정보로만 채용근거를 남긴다”며 “웹의 개인정보도 이렇게 오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