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축소와 성장 중시 정책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중요한 기둥이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 집집마다 행복의 웃음이 피어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474’ 비전 달성이 힘들어진 큰 원인이 됐다.
가계부채 축소 공약이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현 정부의 지지기반인 5060세대의 박탈감이 커졌다. 대출 규제 완화를 ‘빚내서 집을 사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50대 회사원, 퇴직금에다 은행 대출을 더해 장사를 시작했다가 한파에 내몰린 60대 자영업자는 모두 보수 정권이 경제만은 살릴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표를 찍었다. 그러나 “창조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냈다”는 박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23일 공무원상 시상식)이나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안이한 분석(24일 합동브리핑)은 국민의 분노를 살 정도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교양의 재발견
구독
-

법조 Zoom In :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구독
-

BreakFirst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사설]그냥 대학 장학금만 늘릴 게 아니라 졸업장 제값 하게 해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1/22/13048662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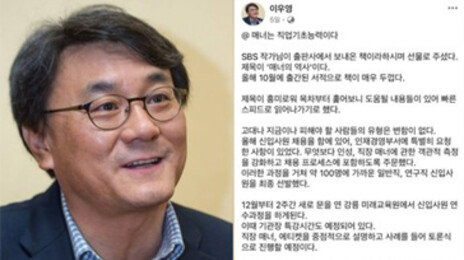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