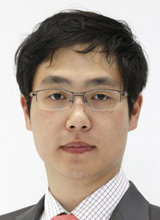
정찬우 신임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첫 출근길은 예상대로 가시밭길이었다. 4일 거래소 부산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취임식은 노조원들의 출근 저지 투쟁으로 무산됐다. 그는 “전 직원의 총의를 모아 더 나은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신임 거래소 이사장이 취임식 연단에 올라 비전 한 줄 발표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 하는 현실이 올해로 증시 개장 60주년을 맞은 한국 자본시장의 씁쓸한 현주소다.
거래소 노조의 반발은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정 신임 이사장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 참여했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부위원장 시절 금융계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실세’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난달 거래소 이사장에 공모한 사실이 알려지자 낙하산 꼬리표가 붙었다.
정 이사장으로선 제대로 된 공모 절차를 밟았고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과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쳤는데 낙하산 인사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모 과정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낙하산 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공모 과정은 맥이 쑥 빠졌다. 6명의 후보 중 거래소 이사장 후보에 단골로 등장하던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는 없었다.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던 최경수 전임 거래소 이사장도 지원을 포기했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수부대 출신 특공대 낙하산’이 내려온다는 말이 돌면서 민관의 실력자들이 몸을 사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 신임 이사장은 단독 후보가 됐고 일사천리로 한국 자본시장을 이끄는 수장 자리까지 올랐다.
정 신임 이사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낙하산 인사라는 낙인을 실력으로 극복할 일만 남았다. 당장 한미약품 늑장 공시 논란과 같은 긴급한 현안부터 챙겨야 한다.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중장기 과제도 그의 책상 앞에 잔뜩 쌓여 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일이다. 활력을 잃어가는 자본시장을 되살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세력을 솎아내는 데도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노조와도 툭 터놓고 대화하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 다만 거래소의 핵심 경쟁력을 훼손하는 타협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어떤 내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세간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이건혁 경제부 기자 gun@donga.com
뉴스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동아광장
구독
-

임용한의 전쟁사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