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벤처 1세대 ‘바이로메드’의 성장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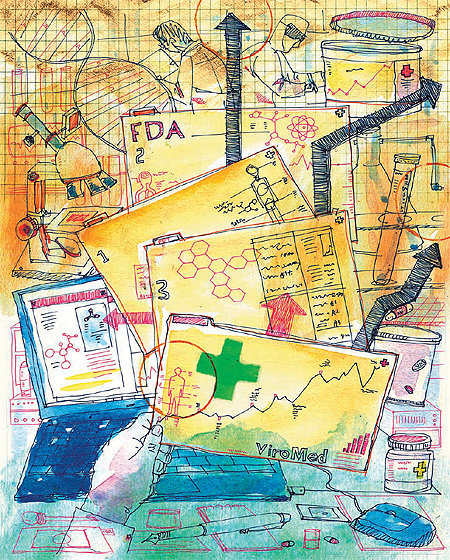
바이오 신약 개발은 종종 ‘로또’에 비유된다. 시장성 있는 신약 하나만 잘 개발하면 10조 원 이상의 연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류머티즘 치료 신약 ‘휴미라’나 로슈가 개발한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암젠의 ‘엔브렐’ 등이 모두 10조 원 안팎의 연간 매출을 올리는 바이오 신약이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한국 제약사 중 세계시장에서 신약 개발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둔 기업은 드물다. 신약 개발에는 10년 이상의 시간과 3조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투자해도 성공률은 채 10%를 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바이오 벤처 1세대 중 대표주자로 꼽히는 ‘바이로메드’가 자체 기술력과 자금 동원력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3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국내 바이오 업계에 큰 시사점을 준다. 바이로메드의 성공 요인과 국내 대형 제약사들에 주는 시사점을 담은 DBR(동아비즈니스리뷰) 225호(2017년 5월 2호) 케이스 스터디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의학적 미충족 수요 만족

바이로메드가 자체 개발한 DNA 치료제 기반 기술인 pCK 벡터는 다양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 pCK 벡터에 다른 치료 유전자를 집어넣으면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 유방암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한 바이로메드의 대표 제품군이 바로 ‘VM202 라인’이다. 바이로메드는 pCK 벡터에 간세포증식인자(HGF) 유전자를 집어넣어 VM202-DPN(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을 개발해 미국 FDA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3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당뇨병성 신경병증(DPN)으로 인한 통증 처방약 시장은 연 5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VM202’를 바탕으로 바이로메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의 치료제로도 개발하고 있다. 현재 허혈성 지체질환 치료제인 ‘VM202-PAD’는 미국에서 임상 2상을 마치고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김 교수는 “VM202 제품군의 치료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로메드는 창업 초기부터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신약을 개발했다. 미국이 전체 의약품 시장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데다 미국에서의 임상 시험과 의약품 승인은 다른 국가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바이로메드처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 일단 미국 FDA 임상을 통과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FDA에서 임상을 수행했거나 진행 중인 신약들이 승인받을 확률은 평균 9.6%에 불과하다. 임상에 드는 비용 역시 최소 1조 원 이상으로 웬만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소규모 바이오 벤처가 도전하기는 매우 어려운 분야다.
또 대규모 제약회사나 바이오 벤처기업들은 임상시험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대행해줄 별도의 전문 기업을 활용한다. 환자모집, 임상시험 관리, 제품 허가 절차 진행 등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진행해주는 기업에 많은 돈을 주고 임상시험 절차를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바이로메드는 처음부터 과감하게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직접 몸으로 뛰며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획득했다. 이를 통해 바이로메드는 전문 회사에 위탁하는 비용의 30%만 들이면서 미국 FDA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 경영과 연구 분리로 전문성 강화
2000년을 전후해 한국에서는 바이오 벤처 창업 붐이 일었다. 당시 장밋빛 미래를 낙관하며 기술만 믿고 창업에 나섰던 수많은 연구자들이 경영, 자금·리스크 관리, 마케팅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너지고 좌절했다. 그러나 바이로메드는 남다른 행보를 보였다. 창업자가 과감하게 경영에서 일찌감치 손을 떼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한 것. 2009년 바이로메드는 삼성물산 출신으로 로커스테크놀로지스라는 시스템통합(SI)업체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김용수 현 대표를 영입해 경영 전반을 맡겼다. 이후 김 교수는 연구에만 전념했다.
김동원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바이로메드를 성공한 바이오 기업으로 부르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기술력 하나로 시가총액 1조5000억 원 수준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 이 회사의 성패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선스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웅 기자 jwoong04@donga.com
DBR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특파원 칼럼
구독
-

정용관 칼럼
구독
-

내가 만난 명문장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DBR]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진화](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2/29/130749071.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