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이끄는 K-스마트시티]<3·끝>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한 제언
한국형 스마트시티 성공 열쇠는 ‘민간참여’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유비쿼터스시티(U-City)부터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해왔다. 일반 시민이나 기업들의 참여가 미흡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 강국인데도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4차 산업혁명 이끄는 K-스마트시티’ 시리즈 3회에서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한 전문가 제언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한국의 신도시 건설 경험과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발판으로 스마트시티를 수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핀란드 헬싱키의 쇠락한 공업지대였던 칼라사타마 지역. ‘버려진 항구’로 불리던 이곳은 현재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총동원돼 스마트시티로 변신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차로 입주한 주민 3000명이 스마트시티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 민간기업, 전문가, 시민단체로 이뤄진 ‘혁신가클럽’도 운영된다.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칼라사타마 자체가 스마트 서비스와 생활을 실험하는 공간”이라며 “한국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만 하다 끝난 것은 관련 기술과 이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K-스마트시티’가 성공하려면 시민과 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도시에 첨단기술을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체감하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서비스가 나온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도 기업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스마트시티 조성에 참여한 시스코의 최귀남 상무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확대하려면 재원 조달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의 공공 주도 방식에선 한계가 있다”며 “민간을 끌어들여 수익을 창출할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유비쿼터스 시티(U-City)’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문 사이 선진국은 스마트시티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풍부한 신도시 건설 경험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강점을 살려서 도시 개발이 활발한 아시아, 중동 등을 타깃으로 스마트시티 수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한 한국의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은행(WB)은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내년부터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신도시 개발 경험을 신흥국과 공유하는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도 해외 수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백지 상태에서 첨단 기술을 집결해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시범도시)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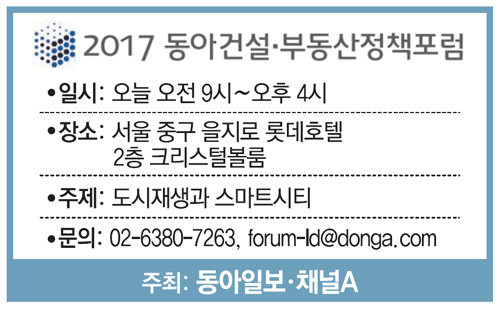
4차 산업혁명 이끄는 K-스마트시티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HBR insight
구독
-

동아광장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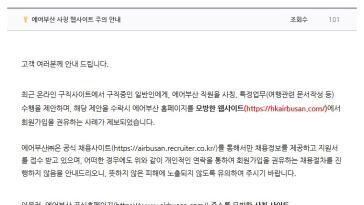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