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상권분석서비스 ‘지오비전’ 조사

서울 청계천 광장을 중심으로 한 광화문 시청 종각 등 ‘강북 도심 지하철 3역’ 일대가 특급 상권으로 떠올랐다. 직장인 위주였던 오피스 상권이 2016년 말 촛불집회 이후 시민들이 대거 찾는 ‘광장형 상권’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3일 SK텔레콤의 상권 분석 서비스인 ‘지오비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상권 중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상권이 연 매출(5조8355억 원)과 1인당 매출(390만 원) 모두 1위였다. 1인당 매출은 상권의 연 매출을 유동인구로 나눈 것으로, 해당 상권을 방문한 사람이 소비한 금액을 뜻한다. SK텔레콤은 전국 기지국의 트래픽 정보와 상가업소 등을 분석해 주요 상권 100여 개를 추린 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들 상권의 연간 매출액을 비교했다. 대형 백화점 매출액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전국 연 매출 2위는 서울 강남구 삼성역권으로 5조3699억 원이었고, 강남구 선릉역권(4조7870억 원), 강남역 북부(4조895억 원)가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코엑스와 어학원 등이 밀집한 젊은 층의 핫플레이스로 꼽힌다.

1인당 월평균 매출도 광화문역권이 39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강동구 천호역권으로 320만 원이었다. 1인당 월평균 매출이 300만 원을 넘은 곳은 이 2곳뿐이었다. 천호역권에는 로데오거리와 주꾸미골목 등이 있어서 학생과 직장인뿐 아니라 경기 하남 시민까지도 대거 흡수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비싼 임대료로 폐업하는 가게가 늘면서 강남은 임대료가 재조정되는 양상이다. 2016년 17만 원까지 치솟았던 압구정, 신사역 인근은 각각 13만 원대로, 13만∼15만 원 선이었던 강남역 부근은 12만8000원대로 각각 떨어졌다. 삼성역은 평당 12만5700원까지 올랐다.
신동진 shine@donga.com·주애진 기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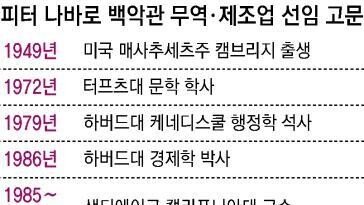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