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소비’ 열풍에 토종 득세… 고가 해외 브랜드도 맥 못 춰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위클리 리포트] 제2전성기 맞은 K뷰티
중국서 고전하는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
판매 10위권에 자국 브랜드가 4개
경기 침체로 프리미엄 전략 안 통해

인구 14억 명의 세계 최대 내수 시장으로 한때 한국 최대 화장품 수출국으로 꼽혔던 중국이 최근에는 해외 브랜드의 무덤으로 변하고 있다.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궈차오(國潮·애국 소비) 경향이 짙어지면서 중국 토종 브랜드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이 화장품 시장으로도 번지면서 중국에서 프리미엄 전략을 유지해 온 글로벌 뷰티 브랜드들의 판매량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13일 유로모니터와 KOTRA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화장품 시장 판매 상위 10대 브랜드 중 중국 업체는 4곳이다. 바이췌링(百雀羚), 쯔란탕(自然堂), 포리야(珀麗雅), 웨이눠나(薇諾娜) 등 한국인에겐 생소한 브랜드들이 일본 SK-Ⅱ, 미국 라메르 등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보다 많은 판매량을 보였다.
중국 화장품 브랜드의 약진은 곧 글로벌 브랜드의 부진으로 연결됐다. 중국 중저가 색조 시장 강자로 군림했던 메이블린은 갈수록 점유율이 하락하자 지난해 중국 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완전 철수했다. 베네피트도 중국 백화점 매장에서의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달 미국 화장품 업체 에스티로더가 2분기(4∼6월) 영업적자를 냈는데, 중국 등 아시아 지역 면세 매출이 부진한 데다 중국 내 판매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뎌 재고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중국 소비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해외 화장품 브랜드들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중국 화장품 소비 금액은 24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줄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같은 달 중국 전체 소비가 2.5%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글로벌 브랜드들은 중국 토종 브랜드에 중저가 시장을 내주더라도 프리미엄 제품에서의 경쟁력은 유지하는 전략을 써왔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중국 내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고가의 해외 브랜드 화장품 판매량이 먼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최근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객(유커)의 한국행을 허용하면서 중국인들이 다시 한국산 화장품을 쓸어 담을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 업체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방 화장품 브랜드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대표 제품 ‘천기단’을 13년 만에 재단장(리뉴얼)했고,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제품 중 인삼 성분을 담은 고가 라인인 ‘진설’을 선보였다. 유커와 중국인 내수 시장까지 염두에 둔 신제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최고로 대접받았던 한국 화장품의 전성기가 다시 돌아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배우 이상아 애견카페에 경찰 출동…“법 개정에 예견된 일”
-
2
트럼프 안 겁내는 스페인…공습 협조 거부하고 무역 협박도 무시
-
3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4
美국방차관 “한국이 北 상대 재래식 대응 책임지기로 합의”
-
5
美국방 “폭탄 무제한 비축…이틀내 이란 영공 완전 장악할것”
-
6
하메네이 사망에 ‘트럼프 댄스’ 환호…이란 여성 정체 밝혀졌다
-
7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8
하메네이 장례식 연기…이란 “전례 없는 인파 우려”
-
9
이스라엘 “F-35 아디르 전투기로 이란 YAK-130 격추”
-
10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1
‘증시 패닉’ 어제보다 더했다…코스피 12%, 코스닥 14% 폭락
-
2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3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4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5
“한국 교회 큰 위기…설교 강단서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
6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7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8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
9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
10
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트렌드뉴스
-
1
배우 이상아 애견카페에 경찰 출동…“법 개정에 예견된 일”
-
2
트럼프 안 겁내는 스페인…공습 협조 거부하고 무역 협박도 무시
-
3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4
美국방차관 “한국이 北 상대 재래식 대응 책임지기로 합의”
-
5
美국방 “폭탄 무제한 비축…이틀내 이란 영공 완전 장악할것”
-
6
하메네이 사망에 ‘트럼프 댄스’ 환호…이란 여성 정체 밝혀졌다
-
7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8
하메네이 장례식 연기…이란 “전례 없는 인파 우려”
-
9
이스라엘 “F-35 아디르 전투기로 이란 YAK-130 격추”
-
10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1
‘증시 패닉’ 어제보다 더했다…코스피 12%, 코스닥 14% 폭락
-
2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3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4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5
“한국 교회 큰 위기…설교 강단서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
6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7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8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
9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
10
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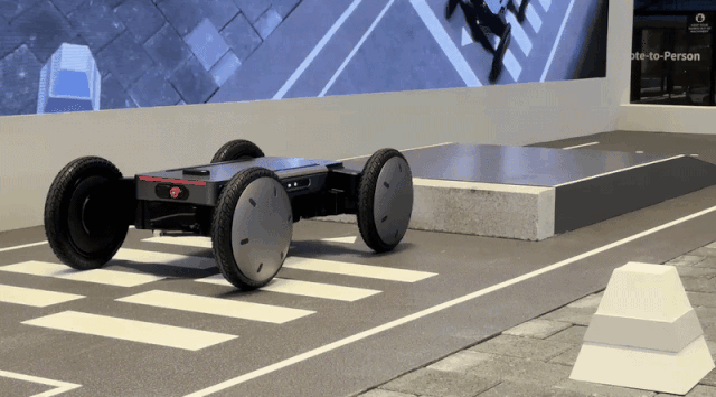
![매일 반복하는 이 습관, 동맥을 야금야금 망가뜨린다[노화설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459256.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