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외신에선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이라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한번 오른 가격이 마치 천장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것처럼 잘 안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식당에서 파는 소줏값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주 회사들은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제조비가 크게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가격을 올립니다. ‘소주 회사에서 출고가를 100원 올렸더니 식당에서는 1000원 올렸다’는 기사를 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소주 원룟값이 떨어지더라도 식당에서 파는 소줏값은 5000원에서 4000원으로 내려오지 않잖아요? 이처럼 한번 오른 가격이 쉽게 내리지 않는 걸 두고 ‘가격이 끈적하다’고 합니다. 치킨값, 월세, 영화 관람료 등 비슷한 예시는 많겠습니다.
한국, 인플레이션 고착화 순위 10개국 중 9위
일주일 전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정도가 포함된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 순위 | 국가 | 근원 물가*(%) | 기대 인플레이션**(%) |
| 1 | 호주 | 3.8 | 4.4 |
| 2 | 영국 | 4.8 | 2.4 |
| 3 | 캐나다 | 3.0 | 4.7 |
| 3 | 스페인 | 3.0 | 4.1 |
| 5 | 미국 | 3.9 | 5.3 |
| 6 | 독일 | 3.1 | 2.2 |
| 7 | 프랑스 | 2.7 | 3.5 |
| 8 | 이탈리아 | 2.3 | 3.3 |
| 9 | 한국 | 2.5 | 2.2 |
| 10 | 일본 | 2.6 | 1.6 |
한국은 이코노미스트가 꼽은 선진 10개국 중 9위였습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덜 고착화돼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물가 상승 국면이 더 빨리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표를 보면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영미권 국가들의 순위가 높고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는 중간쯤, 한국과 일본은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민자 증가, 과거 인플레 경험 등이 영미권 인플레 고착화 유도”
영미권 국가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순위가 높은 이유에는 이민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민 붐’이 일면서 영어 사용 국가로 이민자가 몰린 건데요. 지난해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은 연간 최대 이민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이민 인구가 늘면서 각종 수요도 함께 늘었습니다. 지난해 영미권 국가의 집세는 8% 올랐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5% 늘어나는 데 그쳤고요.
과거 경험도 영향을 줬습니다. 2010년대 남부 유럽과 아시아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이 제한적이었지만, 영미권 국가들의 물가 상승세는 훨씬 견고했습니다. 과거 서로 다른 경험 때문에 국민이 가진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서로 달랐던 거죠.
세종팀의 정책워치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월요 초대석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정용관 칼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총선 결과 무관, 수백 억 ‘수입’ 올리는 거대 양당[세종팀의 정책워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04/08/12438227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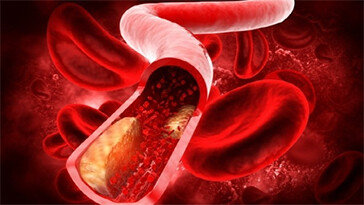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