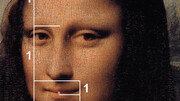동아 사이언스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우아한 라운지
구독
-

이럴땐 이렇게!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