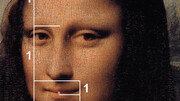동아 사이언스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M-Tech와 함께 안전운전
구독
-

담배 이제는 OUT!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