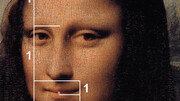영상미와 스타, 좋은 연기, 참신한 기획이나 실험성….
시청욕구를 자극시키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드라마를 만드는 PD들은 ‘이야기(작가)의 힘’을 첫번째 조건으로 꼽는다.
20일 첫회가 방영된 SBS의 40부작 월화드라마 ‘바람의 노래’는 어떨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볼거리는 화면 곳곳에 널려 있다.
검사시보 인규(감우성)는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폭력배들에게 멋진 주먹 솜씨를 선보인다. 그러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폭력배들이 인규를 납치해 테러를 가한다.
호텔 여종업원 선주(신은경)의 아슬아슬하게 짧은 치마는 의도적으로 자주 노출된다. 선주와 도균(이창훈)의 우연한 만남은 부자연스러울 만큼 계속돼 선주를 둘러싼 삼각관계를 예고한다.
그러나 이같은 볼거리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를 빨아들이는 이야기의 힘은 보이지 않는다.
장면들을 하나씩 떼어놓으면 자극적이지만 연결된 화면은 어색하고 설득력이 없다.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이야기의 전개를 양념식으로 소개해야 하는 첫회임을 감안해도 온갖 사건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선주를 둘러싼 사건들이 벌어지다 갑작스럽게 중소기업인의 꿈이 나오는가 하면 노동현장에서 만난 혜균과 영채의 사랑이 튀어나오는 것이 한 예.
캐릭터의 비현실성도 드라마의 흡입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법을 수호하는 검사시보가 폭력배들을 주먹으로 굴복시키는 ‘람보’로 설정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그 람보가 어느날 폭력배들에게 힘없이 납치당하다니.
제작진의 넘치는 의욕이 문제는 아니다. ‘보는 드라마’의 성패는 짜임새 있는 이야기에 달려 있다.
짧은 미니시리즈라면 영상미나 스타로 ‘눈속임’이 가능하겠지만 연속극 또는 일일극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갑식기자〉
동아 사이언스 >
-

작은 도서관에 날개를
구독
-

오늘도 건강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