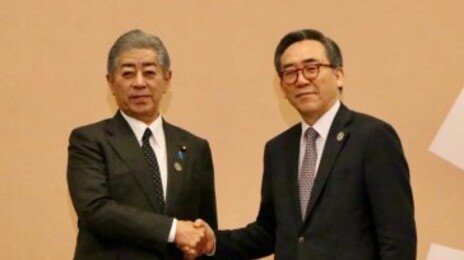창밖에는 태양이 빛나고 들판에는 녹음이 짙푸르건만 극장속은 얼어붙은 어둠과 선홍색 비명으로 가득 찬다. ‘공포의 어머니는 죽음’이라는 오래된 서양의 아포리즘이 맞다면 그 어느 때 보다 생명력으로 가득차야 할 계절을 죽음의 계절로 환치시켜 버리는 주술적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 공포의 저 밑바닥, 그 차가운 지하실로 걸어들어가 보자.
▼기원을 찾아서▼
공포영화의 효시는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1919)을 비롯한 독일 표현주의 영화들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기원은 유니버설영화사가 1931년 나란히 선보인 ‘드라큘라’와 ‘프랑켄슈타인’이 꼽힌다. 분명한 것은 ‘드라큘라’의 개봉시기가 여름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영화는 ‘가장 이상스런 사랑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그해 2월 발렌타인데이에 맞춰 개봉됐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포영화〓여름’ 공식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할로윈데이나 크리스마스시즌에도 만만찮은 공포영화들이 개봉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에서 6월 개봉한 ‘데스티네이션’이나 8월 개봉예정인 ‘크레이지 핸드’는 모두 미국에선 봄철에 개봉된 작품이다.
▼납량의 진실▼
공포영화를 더위를 식힌다는 납량(納凉)과 연결짓는 것은 동양적 전통에서 더 강하다는 분석이다. 일본에서 50년대 괴담영화를 납량물로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월하의 공동묘지’ 등 60년대 대부분의 공포영화들이 여름에 집중 소개됐다. 상명대 조희문교수는 이를 공포물에 대한 동서양의 시각차에서 찾는다. 서양은 근원을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공포의 근원을 찾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의 원한을 풀어주는 한풀이성 이야기를 통해 정서적 으스스함을 맛보는 것에 치중했다는 설명이다.
▼공포영화의 생리학▼
공포영화는 과연 생리적으로 더위를
뇌가보는세상 >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건강 기상청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뇌가 보는 세상]석면… 로켓… 뇌도 스트레스 받는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9/04/10/712140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