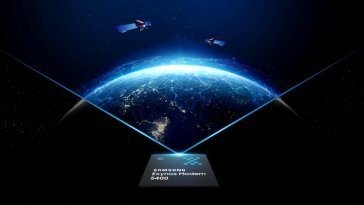내년부터 한국의 디지털 위성방송 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19일 위성방송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컨소시엄은 내년 7월 시험방송을 거쳐 10월부터 본 방송에 들어간다. 위성방송시대가 오면 TV와 관련된 시청자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미디어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해결과제는 무엇인지, 2회에 걸쳐 알아본다.
2001년 10월 어느날, 50대 주부 김모씨는 거실의 TV를 켠다.
TV리모콘에서 ‘즐겨보기’ 버튼을 누르자 드라마, 영화, 홈쇼핑 등의 채널 번호와 프로그램 시간이 화면에 나타났다.
딸 총명이가 ‘TV맹(盲)’인 엄마를 위해 평소 김씨가 즐겨 보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모아 놓은 것. 채널이 100여개(공중파+케이블+위성방송)나 되다보니 언제,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외우기도 어렵다.
컴퓨터를 못해 ‘컴맹’,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쓸 줄 몰라 ‘폰맹’이라는 말을 들었던 김씨는 위성방송이 시작된 후 ‘TV맹’이라는 별명이 하나 더 추가됐다.
김씨가 선택한 채널은 71번. 하루종일 드라마만 틀어주는 채널이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니시리즈 ‘가을동화’가 다시 방영 중이다. 주인공의 엄마인 선우은숙의 구두를 눈여겨보던 나씨는 딸 총명이를 불러 “저 구두 좀 사다우”하고 부탁한다.
총명이가 리모콘에 달린 볼 마우스를 움직여 TV화면의 커서를 구두에 놓고 클릭하자 우측 상단에 작은 창이 뜬다. 가격, 색상, 사이즈 등 화면의 설명에 따라 선택하자 ‘주문이 완료됐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창이 사라졌다.
김씨는 “신기하다”며 감탄을 연발하고 조만간 ‘TV맹’에서 탈출할 것을 결심했다. 컴퓨터나 휴대폰에 비해 TV리모콘은 그래도 쉬울 것 같다.
총명이는 내친 김에 E메일도 체크한다. 리모콘의 ‘데이터 채널’을 누르자 즉시 인터넷에 접속되면서 TV화면 하단에 자막처럼 새로 도착한 E메일이 지나간다. 엄마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 동안 총명이는 무선 키보드를 꺼내 바로 답장 메일을 ‘날렸다’.
이런 생활의 변화가 우리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다.
내년 7월이면 21세기 ‘멀티미디어의 총아’로 떠오른 ‘디지컬 위성방송’이 시범방송에 돌입한다. 위성방송이 시청자에게 가져올 가장 큰 혜택이자 특징은 바로 이같은 ‘다채널’ ‘고화질’ ‘다기능’ ‘쌍방향성’.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은 내년 74개 채널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114개 채널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 케이블에 가입한 가정이 볼 수 있는 채널이 최대 40개 정도인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는 셈.
채널도 전문화, 세분화돼 스포츠는 배구, 골프 등 종목별 전문채널이, 영화는 액션, 멜로 등 장르별 전문 채널이 생겨날 수 있다. 음악도 록 매니아를 위한 전문 채널이나 노인을 위한 실버채널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전문잡지형 방송’이 되는 셈.
소수의 시청층을 겨냥,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니치(틈새) 채널’도 가능하다. 실제로 일본에는 하루종일 바닷가 풍경을 배경으로 클래식 음악만 틀어주는 환경채널이 등장해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즐겨 방영되고 있다.
이같은 틈새채널은 대여섯명의 인원으로 방송이 가능하다. 수백명의 제작인원이 필요한 기존 방송사 시각으로서는 보면 ‘개념 파괴’인 것. 투자비용이 적은 틈새채널은 2만∼3만 가구만 확보해도 손익분기점을 간단히 넘을 수 있다. 이를 공중파 시청률로 환산하면 한자릿수도 안된다. 하지만 채널이 폭발적으로 늘면 앞으로는 ‘허준’과 같이 시청률이 60%가 넘는 드라마는 점점 나오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물론 이같은 예측은 위성방송사업이 차질없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콘텐츠 확보 문제. 독립 프로덕션들이 아직 영세한 규모인데다가 지상파 TV에서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이 적지 않은데 앞으로 채널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 과연 누가, 무엇으로 이를 채울 것인지가 고민거리다.
자칫 싸구려 외국 프로그램을 사다 틀거나 지상파에서 이미 방영된 내용을 재탕, 삼탕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공적인 위성방송 시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케이블TV의 실패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위성방송의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