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는 개봉하기 훨씬 전부터 ‘끝내준다’는 소문이 충무로에 자자했다. 사실 이런 소문은 강우석 감독의 측근들에게서 흘러나왔다. 개봉 직전에는 정반대의 소문이 떠돌았다. 돈을 많이 쓴 대작 티가 나지 않는 영화이며 기대보다 엉성하다는 것이다. 공식 시사회가 끝난 후 나온 대다수 언론의 리뷰도 소심한 편이었다. 실화 소재가 주는 감동은 인정했지만 완성도에는 의문을 표했다. 정작 감독 자신은 ‘실미도’가 평론가나 기자를 위한 영화가 아니며, 대중의 호응을 얻을 영화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물론이다. ‘실미도’는 대중을 위한 영화다. 긴가민가했던 이 영화의 완성도는 일단, 관객을 울리는 데 부족함이 없다. 여기 담긴 역사적 실화의 소재는 누구라도 외면하기 힘든 충격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북한 남파 특수부대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침투 시도에 충격받은 남한 정부가 김일성 제거를 목적으로 1968년 4월 창설한 실미도 684 북파부대의 얘기는 무지막지한 야만성을 드러낸다. 강우석의 연출은 실제 기록에 근거해 ‘국가는 악이고 국가에 희생된 개인들은 선’이라는 뚜렷한 이분법적 구도로 이야기를 끌어내면서 오락적 재미를 추구한다.
‘실미도’의 재미와 감동은 역설적으로 단순한 역사적 해석에서 나온다. 영화는 박정희 정권 시대의 군국주의와 외교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 명분 없는 전쟁에 내몰린 병사들의 욕망과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국가 권력과의 대립에 주목한다. 이 영화를 비판하는 이들도 과거 우리 국가 권력이 젊은이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다루고 결국에는 그들의 정신을 어떻게 황폐하게 했는지 증언하는 대목에선 막막해진다. 자폭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무지막지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실화가 주는 압도적인 느낌에 힘입어 ‘실미도’는 관객이 등장인물에 감정이입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이 촌스러운 영화가 상투적이면서 상투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은 부대원들 내부의 야만성, 한때 실재했으나 우리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 야만성에만 오로지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제작비 80여억원을 들인 이 영화에서 대작의 기풍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유감이다. 화면은 1970년대 한국 영화를 다시 보는 것 같다. 실미도에 세워진 오픈 세트의 위용을 세련되게 드러내는 롱 쇼트 하나 없다. 지중해 몰타 스튜디오에서 찍었다는 밤바다 항해 장면도 잠깐 나올 뿐이다. 뉴질랜드까지 가서 찍은 눈 덮인 산에서 훈련하는 장면도 애들 장난 수준이다. 이런 때깔로도 감동을 준다는 것은 ‘실미도’가 배우들의 영화라는 것을 말한다. 북파 부대원의 중심 인물인 설경구의 부들부들 떠는 눈빛은 익숙하지만 여전히 흡입력이 있고,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부대장 역의 안성기는 특유의 포커페이스에 잔주름 많은 얼굴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다. 강우석의 연출은 그들의 감정을 드러내 과장하지 않는 대신 감정을 살려야 할 때는 꼭 살리고 넘어간다. 사실 한국 영화가 이 정도로 여유를 갖고 부당한 국가권력을 비판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실미도’는 한눈 팔지 않고 한 시대의 맨얼굴을 드러내 우리에게 슬픔을 전해준다. 오락영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진 않으나 그래도 이런 현실은 한번쯤 되돌아봐야 하지 않느냐는 태도는 ‘실미도’를 볼 만한 대중영화로 끌어올렸다.
김영진/ 영화평론가 hawks1965@hanmail.net (주간동아 419호)
영화 >
-

이럴땐 이렇게!
구독
-

이헌재의 인생홈런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이제야 개인 폰 바꾼 대통령 부부[횡설수설/이진영]](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501031.3.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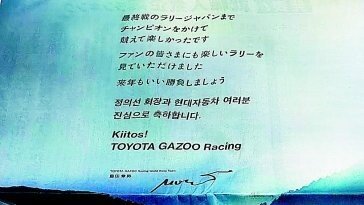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