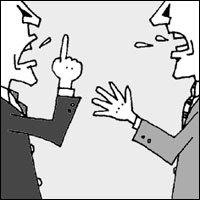
▷양파껍질처럼 계속 벗겨도 논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논리를 구성하는 개념들의 정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공정성’의 정의가 서로 다르니 논쟁을 백날 해도 헛돌기만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쟁 당사자가 상호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다잡고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주로 옳고 그름, 선함과 악함, 아름다움과 추함 등 ‘가치 논쟁’의 첫 단계는 이렇게 논쟁 대상에 대한 정의를 상호 토론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논쟁의 기술도 발달하면서 18세기 무렵 수사학자들은 ‘정책 논쟁’의 기법들을 발명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정적인 가치에 대한 논쟁을 즐겼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방향성이 분명한 정책을 놓고 구체적인 합의를 위해 토론하는 일이 훨씬 많아졌다. 그러나 사실 정책 논쟁도 출발은 가치 논쟁에서 시작한다. 정책 논쟁에서도 개념의 정의를 각기 다르게 이해한다면 논의는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한다.
▷탄핵 보도의 공정성 시비는 신문과 방송이 맞서는 구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애초 그 논쟁은 언론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학문적으로 규명한다고 해결될 사안은 더욱 아니었다. 논의의 수준이 개념에 대한 정의에서 맴도는, 우리 사회의 두개의 다른 가치관이 맞서는 논쟁인 것이다. 양측이 화합할 수 없는 건, 애당초 서로의 자에 그어진 눈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옛날 진시황도 도량형을 통일하는 데서 국가 통합의 기틀을 잡아 나갔다. 언론과 정부, 신문과 방송, 메이저와 마이너 언론들이 ‘공정성’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갖는 데서부터 언론 개혁은 시작돼야 한다.
박성희 객원논설위원·이화여대 교수·언론학
shpark1@ewha.ac.kr
횡설수설 >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임용한의 전쟁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횡설수설/이진영]목소리 잃은 ‘미국의 소리’… 미국의 적에게 주는 선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3/17/131225827.2.jpg)

![[사설]연금특위 구성 신경전… 겨우 합의된 모수개혁도 허사 될라](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226304.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