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할리우드 공포물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의 매력은 기존 공포영화의 문법을 살짝 뒤집었다는 데 있다. 죽음을 예측 불허의 대상으로 상정함으로써 공포감을 조성했던 과거 호러 영화의 관습과 달리, ‘데스티네이션’은 인물들에게 닥쳐올 죽음을 관객이 100% 예상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긴장과 공포를 유발하는 역발상을 시도했다. 게다가 악마나 살인마와 같은 타자(他者)가 아니라 현실생활에서 흔히 접하지만 늘 속으론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대상(비행기나 자동차 같은)을 공포의 소재로 삼아 ‘내 안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전략도 지혜롭다.
2000년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킨 영화 ‘데스티네이션’이 속편 ‘데스티네이션 2’(2003년)를 거쳐 완결편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11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반인 웬디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찾는다. 롤러코스터에 타려던 그녀의 머리에 왠지 끔찍한 사고의 모습이 스쳐지나간다. 웬디는 기겁하고 타지 않지만, 예정대로 출발한 롤러코스터는 여지없이 참혹하게 박살이 난다. 웬디는 자신이 찍은 사진 속 친구들에게 차례로 죽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죽음의 그림자는 웬디를 찾아온다.
1편으로 감독 데뷔했던 제임스 웡이 다시 연출을 맡은 완결 편 역시 죽음의 이유보다는 죽음에 이르는 각종 방법들을 전시하면서 승부를 보려 한다. 이 영화의 성패는 한 명 한 명을 어떤 기발하고 주도면밀하면서도 화려(?)한 기술로 죽이느냐 하는 아이디어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파이널…’은 젊은 관객층을 노린 냄새가 짙다. 죽음이 찾아오는 장소는 롤러코스터나 선탠 기계 안, 아르바이트 장소나 헬스클럽, 그리고 폭죽놀이를 하는 공원처럼 10, 20대에겐 아주 친숙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죽음의 예언자로 등장하는 건, 이들이 휴대전화만큼이나 몸에 끼고 사는 일명 ‘디카(디지털 카메라)’다.
완결 편은 죽음에 이르는 방법마저 사진에 암시되어 있다는 새로운 설정을 추가해 기존 시리즈에 대한 변주를 시도한다. 각 인물에게 죽음이 일어날 거라고 관객이 예측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반 박자 앞서거나 반 박자 늦춰 참사가 발생하도록 만들어 충격 효과를 배가시키는 ‘시간차 공격’은 여전하다.
‘파이널…’은 특히 살해 테크닉에서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는 훼손하는 신체 부위가 머리에 집중돼 있다는 점. 머리 훼손은 강도 높은 참혹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심리효과를 낸다. 둘째는 사지절단보다는 몸을 아예 분쇄해버리는 방식으로 ‘끝장’을 보는 악취미적인 아이디어가 적지 않다는 점. 이런 끔찍한 모습들은 마치 즐거운 축제라도 벌이는 듯 빠른 속도감과 경쾌한 리듬에 맞춰 ‘산뜻하게’ 등장했다가 사라진다. 관객이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어느 순간 죽음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끔 말이다 (‘꿈의 공장’이라는 할리우드는 죽음마저 신바람 나는 오락으로 만들어 낸다).
대신 ‘운명’이란 단어가 갖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1편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건 약점. 죽음의 연쇄작용을 만드는 정교한 설정이 사라지고, 바닥에 떨어진 초콜릿 바를 쥐가 갉아먹다가 전기선을 건드려 지하철이 탈선된다는 식의 설정은 작위적인데다 손쉬운 기획상품 같은 냄새를 풍긴다. 톡 쏘긴 하지만 숨통을 점점 조여 오는 지독한 맛이 떨어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18세 이상.
이승재 기자 sjda@donga.com
스크린산책 >
-

오늘과 내일
구독
-

한규섭 칼럼
구독
-

담배 이제는 OUT!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스크린 산책]‘레밍’ & ‘안소니 짐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6/05/12/697052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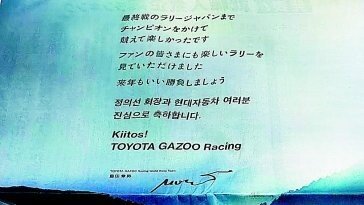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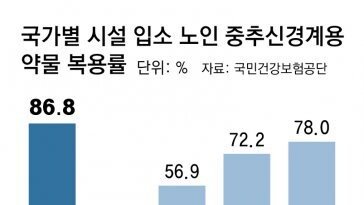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