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명준 감독 ‘우리 학교’를 보고
여러분, ‘우리 학교’라고 들어보셨는지. ‘우리 학교’는 어디에 붙어 있는 대안학교가 아니라 일본에 있는 조선민족학교 아이들에 대한 영화 제목이다. 그것도 아주 재밌고 웃기고 슬프고 감동적인 영화.
일본 조선인 민족학교라니! 어떤 시댄데 아직도 이데올로기를 들먹거리며 운동권 영화로 혹세무민하느냐고? 한번 보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라. 이곳엔 사람이 있다. 우리와 같은 말과 얼을 가진 사람이.
최근 한국 영화 위기론이 무성하지만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보고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한국 영화의 희망이 보였기 때문이다.
광복 직후 조국으로 오지 못한 일본 국적의 재일동포들에게는 ‘식민지 이전 시대의 조선’ 국적이 부여됐다. 그래서 영화 속 아이들 중에는 일본 국적도, 한국 국적도, 조선 국적도 가진 아이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향은 남쪽이지만 자신들을 위해 주는 조국은 북쪽’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조선학교가 세워진 초창기에 북한 정부는 교육 원조비를 지원했지만 남쪽은 재일본 조선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일본 사회에서 일본인으로 자라난 아이들은 이 학교를 통해 비로소 조선인으로 성장한다. 한 남학생은 “남조선에서는 내면적인 것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되지만 재일동포들은 내면에서 지키고 있어도 외면으로 나오지 않으면 결국 일본 사람같이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100% 우리말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여학생들은 날씨가 추워도 치마저고리 교복을 입는다.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나 일본 우익단체들에 상처받는 모습은 심각한 고민을 던져 주지만 수업시간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나 운동회를 마치고 서로 콜라를 부어대는 모습은 코미디 프로그램만큼 배꼽 빠지게 만든다.
류승완 영화감독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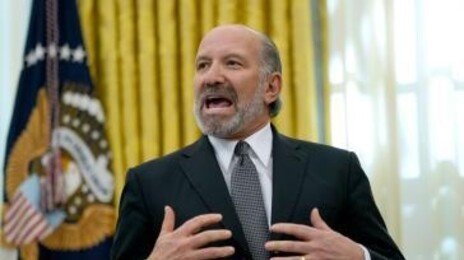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