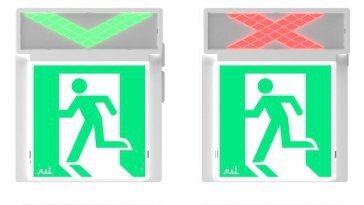방 씨는 아직도 그 날만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솔직히 정말 촌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인연이 되려고 했는지, 대화를 나눌수록 듬직해 보이더라고요. 한 번만 더 만나볼까, 하다가 시간이 흘렀죠.” 1996년 11월24일. 두 사람은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다.
그 후 벌써 13년째다. 부침이 많은 세월이었지만 방 씨는 든든하게 마해영의 곁을 지켰다. 최고의 자리에서 프로야구를 호령할 때도, 팀에서 방출 당해 괴로워할 때도 늘 한결 같았다. “경기에 못 나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워낙 성실한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속은 상해도 조급하지는 않았어요.”
마해영에게 고려대 체육교육과 대학원 진학을 권유한 것도 방 씨다. 은퇴 후 진로를 고민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마해영은 지난해 경기에 못 나가는 대신 대학원 수업을 꼬박꼬박 챙겼다. 이제 논문만 쓰면 석사모를 쓸 수 있다. 마해영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아내 말 듣길 잘 한 것 같다”며 웃었다.
힘든 시간을 겪는 동안 부부의 사이도 더 돈독해졌다.마해영은 이제 은행 업무도 볼 줄 알고,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데도 도가 텄다. 방 씨가 “결혼 12년 만에 팔자가 폈다”며 웃을 만도 하다.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남편을 따라 이사를 한 것도 “이런 게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방씨는 인터뷰를 마치고 총총히 발걸음을 옮겼다. 남편을 사직구장으로 출근시켜주기 위해서다.
부산=배영은 기자 yeb@donga.com
[관련기사]마해영 “선입견 없이 날 봐준 로이스터 감독님…”
[관련기사]‘연습생’으로 돌아온 마해영의 야구인생 ‘종점은 부산’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