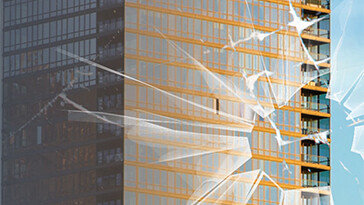“패널들의 치열한 논쟁에 끼어들어 교통정리를 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하지만 ‘끝장토론’에서는 안 합니다. 그저 한발 뒤로 물러나서 기다려 줘요. 이번처럼 인내와 체력이 필요한 진행은 처음이네요.”
매주 금요일 밤 12시에 방영되는 XTM ‘끝장토론’에는 토론 프로그램 특유의 딱딱한 형식이나 발언의 수위 조절이 없다.
그 대신 ‘센’ 언어와 다듬어지지 않은 논리들이 자웅을 겨룬다. “토론회인지 싸움터인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줄을 잇는다. 이쯤에선 누군가가 나서야 할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 그래도 진행자는 가만히 있는다. 사회자의 진행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절제돼 있다.
이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은 백지연(44) 씨를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PJY홀딩스 건물에서 만났다.
반듯하고 도도한 이미지,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백 씨도 “끝장토론을 녹화하는 월요일은 끔찍한 전쟁”이라고 혀를 내두른다. “패널들과 시민논객들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발언에 녹화하는 4시간 동안은 초긴장 상태”라고 말한다. 생방송으로 하지 않는 것도 언제 방송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다고 막가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웃음) 그 얼굴에 그 얼굴이 나와 그 소리에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닌 토론의 맨얼굴을 보여 주자는 거죠. 물론 논지에 어긋나고 수위를 넘은 논객들의 발언을 들으면 진행자로서 정리하고 싶은 본능이 발동해요. 하지만 조금만 참고 지켜보면 무릎이 탁 쳐질 만큼 훌륭한 발언들을 건질 때가 많아요.”
앵커로 시작한 방송인 생활도 21년째. “시사앵커가 천직”이라고 밝히는 백 씨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수없이 많은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기자와의 인터뷰 도중에도 논지에서 벗어난다 싶은 질문은 과감히 지적해 준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단골 패널과 논객들 중 달변가를 가려내는 자신만의 눈도 생겼다.
백 씨가 생각하는 비호감 논객은 두 가지 유형이다. “국가의 미래를 운운하는 정치인과 대안 없이 사회정의만 부르짖는 입만 발달된 사람들”이다. 백 씨는 어눌한 듯해도 진정성을 담은 안철수 씨를 가장 인상 깊은 인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의 토론 문화에 대해 “누구나 가상과 현실 공간을 넘나들며 의견을 개진하는 세상에서 비로소 토론문화의 봇물이 터진 것 같다”고 긍정하면서도 따끔한 질책을 잊지 않는다. “물론 토론은 게임이고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토론의 시작은 듣는 거예요. 내가 더 맞고 네가 틀렸다는 것을 강요하는 토론문화, 이제 끝장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