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판 언저리를 배회하며 그럴듯한 말을 꿰어내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하는 족속. 가증스럽다.”
지난달 술자리에서 우연히 안면 튼 한 감독의 말이다. 기자와 평론가 등 영화를 재료 삼아 글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표현은 걸걸했지만 무턱대고 싸잡은 비난이 아니었다. 개인 취향에 따른 호오(好惡)의 대상을 갈라내는 과정에서 나온 언사였기에 딱히 맞장구치거나 반박할 까닭이 없었다. 그저 역시 개인 취향에 근거한 의견으로 답했다.
자리를 빠져나와 집에 좀 못 미친 곳에서 택시를 세우고 한참을 느릿느릿 걸었다. 혼자 괜히 생각이 많아진데다 속도 좀 울렁거렸다.

영화 쪽 취재. 겨우 2년 남짓이었고 그나마 벗어난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이력이라 어디 들이밀 수 없는 경험인데다 좋은 기자로 인정받아 본 적도 없다. ‘영화를 재료로 한 글쓰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주절거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데스크의 꾸짖음은 늘 “잘난 척 하지 마라”였다. 잘난 척할 깜냥과 지식이 한 톨도 없으면서 매번 그 소리를 들은 걸 보면, 언젠가 한 선배에게 지적받은 대로 내 ‘애티튜드’에 큰 문제가 있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불행하기만 했는가. 그건 아니었다. 쓰리고 저린 만큼 가슴 뛰었고 때로 즐거웠다. 왜였을까.
소설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 고등학교 때였다. 독고영재와 최민수가 주연한 영화는 보지 못했다.
주인공 임병석은 한국이라는 변방에 날려 온 할리우드 영화의 이삭더미에 파묻혀 성장한 인물이다. 환등기 속에 앉아있다시피 하며 성장한 그는 당연히 현실사회 시스템에의 원만한 적응에 실패한다. 하지만 그 실패는 같은 작가가 비슷한 시기 펴낸 다른 히트작 ‘하얀 전쟁’ 결말의 비통한 실패와는 달랐다. 임병석의 실패에는 위트와 조롱이 있었다. 요거, 몰랐지? 약 오르지?-하는. 순간 부르르 했다가도 피식 웃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한 세월 참말 얄밉도록 알차게 잘도 놀다 간 친구가 남긴 작별 낙서 같은 실패의 유희였다.
변방의 곰삭고 푸석한 이삭더미라도 어쨌든 그 원료는 영화였다. ‘시네마 천국’의 토토와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자말은 각각 이탈리아와 인도 깡촌의 임병석이다. 임병석은 다만 자라서 토토처럼 영화감독이 되거나 자말처럼 퀴즈쇼 우승을 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 편이 훨씬 더, 사실적 아닐까.
영화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흥분시킨다. 강렬하고 달콤한 중독성의 흥분이다. 성인영화 알현의 빈틈을 호시탐탐 노리던 꼬마 임병석의 동그란 두 눈은 광장 벽에 맺힌 흑백 영상을 발견하고 환성을 지르던 토토, 똥 무더기를 뒤집어쓴 채 스타 배우에게 달려가던 자말의 그것과 같았다.

영화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릴 적 탐하던 강렬한 달콤함을 끌어내 곱씹는 행위다. 현상의 영화에 대해 글을 쓰지만 그 과정에서 동원해 의지할 재료는 개인적 경험의 라이브러리다. 그리고 어떤 한 영화에 대한 기억은 결국 그 경험이 구성된 공간, 함께 머물렀던 사람에 대한 기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아티스트’는 보는 내내 하염없이 질투 나는 영화였다.
이 영화가 오스카 5개에 합당한 걸작으로 오랜 세월 거듭 재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유쾌했으나 총체적으로는 안이했다.
콜럼버스의 달걀. 오스카를 염원하는 적잖은 감독과 제작자가 이 영화를 보면서 땅을 치지 않았을까 싶다. 아, 내가 저 생각 왜 먼저 못했을까-하고. 무성영화 시대를 직접 또는 간접 체험의 실체로 기억하는 세대가 삶에서 전원 퇴장하기 간발 앞서 이 영화는 영리하게 등장해 기립박수를 받았다. 찬사는 오직 이번 한 차례일 수밖에 없다. 개봉관에서 무성영화 문법을 따른 장편을 관람할 기회는 아마 ‘아티스트’를 끝으로 영원히 사라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 점을 생각하면 이 마지막 이벤트의 김빠진 후반부는 더욱 아쉽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중반까지의 서울은 지금보다 다양한 영화를 보기에 좋은 환경이었다고 기억한다. 채플린의 무성영화들을 개봉관에서 볼 수 있었으니. 관객도 제법 들었다. 무슨 바람이었는지 중학교 과학실에서 선생님이 ‘키드’를 틀어준 적도 있었다.
‘아티스트’가 줄기차게 활용하는 액션코미디는 채플린 시절 숱하게 리플레이한 것들의 추억담이다. 채플린의 영화가 개봉관에 다시 걸릴 리 없는 시대에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올드 관객은 그 동작 하나하나에 기꺼움의 박수를 칠 수밖에 없다. 그게 이 영화의 미덕 전부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오스카의 자격은 넉넉하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 탭 댄스와 ‘짜잔’은 아무래도 민망했다. 시기를 잘 탔지만 오래 간직될 추억이 되리라 보기 어렵다. 이미 그 자체로 추억담이니.
그럼에도 짜증나게 부러운 것은, 아 저 감독, 제작자, 제작진, 배우들. 만들면서 정말 얼마나 오밀조밀 신나고 재미있었을까 하는 생각이다.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희귀한 장난감을 먼저 발견한 아이들의 신명나는 놀이를 입맛 다시며 멀찍이 물러앉아 구경하는 기분. 배우와 스태프 모두가 영화에 대해 각자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기억을 꺼내 활용해야 하는 놀이. 얼마나 행복했을지.

올해 초 미국 한 연예지의 유명 영화평론가가 해고됐다는 소식이 있었다. 영화에 대해 글 쓰는 행위의 효용은 분명 다른 어떤 글쓰기 행위의 효용보다도 빠르게 지워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기에 “잘난 척 하지 말고 무조건 쉽고 가볍게 쓰라”는 데스크의 꾸지람에 진작 영리하게 순응해야 했을까.
그럴 리가. 그럴 수 있었을 리가.
생산하는 이가 생산물의 시기적 효용을 결정할 수 없다. 운 좋게 찬스를 잡을 수야 있겠지만, 찬스 때만 생산할 선택권을 가진 이도 없다.
영화는 영화. 글은 글. 소통은, 욕심.
영화판 ‘언저리’ 운운은. 글쎄. 나는 아마 그저 늘 객석에 머무른 것 같다. 영화를 즐거워하며. 영화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는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바로 그날 주어진 단 한 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언제나 다짐하듯 생각하면서.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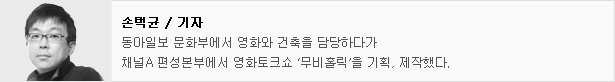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