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개봉 ‘카운슬러’

14일 국내 개봉한 ‘카운슬러’의 성적이 신통치 않다. 19일 현재 10만 명. 애초 영화에 대한 기대는 컸다. 마이클 패스벤더, 페넬로페 크루즈, 브래드 피트, 캐머런 디아즈…. ‘할리우드 올스타’라고 할 만한 호화 캐스팅이다. 시나리오 작가는 소설 ‘평원의 도시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쓴 인기 작가 코맥 매카시, 연출자는 리들리 스콧 감독(76)이다.
영화는 미국에서도 재미를 못 봤다. 관객이 영화를 보고 평가하는 루튼 토마토 지수에서 ‘카운슬러’는 28%를 기록했다. 100명 중 28명만 영화가 볼 만하다고 답한 것. ‘그래비티’는 97%, ‘캡틴 필립스’는 94%를 받았다.
영화가 외면당한 이유는 뭘까. 우선 대사가 너무 많다. 스콧 감독이 소설가의 문자 언어를 영상으로 바꾸는 데 실패한 느낌이다. 영화에서는 인간 내면에 자리한 극한의 악마성을 드러내는 데 백 마디 말보다 장면 하나가 효과적인 법이다.
이 영화들의 예술성과 대중성의 비율을 가르자면 기자는 대중성이 60%, 예술성이 40%라고 말하고 싶다. 제작비가 수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이르는 대작을 만들며 감독은 대중성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스콧 감독은 이런 오락영화 속에 뭔가 생각할 거리를 담아낼 줄 아는 감독이었다.
하지만 그의 나이가 대중성과 예술성의 비율을 40 대 60으로 조정한 것 같다. 화려한 영상과 꽉 짜인 스토리보다 메시지가 전면에 나온다. 영화가 끝나면 관객은 재미 대신 심각한 물음을 받아든다. “아, 이제 스콧의 영화는 어렵구나.”
기자는 지난해 영국 런던에서 ‘프로메테우스’와 관련해 스콧 감독을 만났다. 감기 걸린 백발의 감독은 연방 기침을 하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영화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인간은 비키니 섬(1946년 미국이 핵실험을 한 서태평양의 섬)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라는 선문답 같은 답을 했다. 이제 삶을 정리할 날이 많지 않은 그가 인간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민병선 기자의 영화와 영원히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원주의 날飛
구독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민병선 기자의 영화와 영원히]난무하는 대사에 밀려난 리들리 스콧표 영상 미학](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3/11/21/59035679.2.jpg)
![크리스마스, 산타가 아무리 바빠도 지켜야 하는 ‘이 규정’[이원주의 날飛]](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17225.1.thumb.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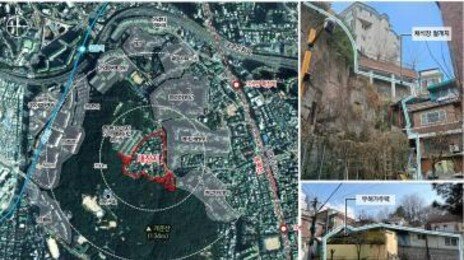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