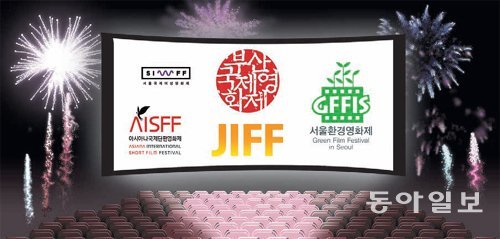

‘한국식 영화제’는 내게 특별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한국식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는 한국 영화제 특유의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인들도 영화 애호가이고 영화 관련 행사를 많이 연다. 벨기에 브뤼셀도 서울처럼 매년 수십 개의 다양한 영화제가 열린다. 그런데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영화제 특유의 분위기, 그러니까 ‘영화제 문화’까지는 없는 것 같다.
한국의 ‘영화제 문화’를 부산에서 처음 경험했다. 2005년 10월, 한국에서 보낸 첫 가을 어느 주말에 아무런 계획 없이 내 친구 문수와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가게 됐다. 그날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아름다운 주말이 된 날이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기 때문에 우린 영화표를 미처 예매하지 못했고, 매진되지 않은 영화가 별로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중 하나를 무작위로 골라 봤다. 그 영화는 이만희 감독의 ‘원점’이었다. 1967년 작품 속 설악산 풍경을 보니 제법 신기했다.
벨기에에서 체험했던 영화제와 달리 그날 부산영화제에서는 영화관의 경계를 뛰어넘는 어떤 ‘정신’을 느꼈다. 영어로 vibe(분위기, 느낌)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부산에서는 영화제의 여운이 길거리에서도 느껴진다. 내가 베니스나 칸 영화제 같은 대규모 유럽 영화 축제에 가본 적이 없어 비교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부산영화제는 영화 관계자나 영화 마니아뿐만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실제 관람객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중 축제같이 느껴졌다. 반면에 브뤼셀 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관객들이 영화를 관람하면서 평소보다 좀 더 시끄럽고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건 영화관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름이다.
2006년 봄에 방문한 전주영화제에서도 이런 영화제 고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전주영화제는 부산영화제보다 ‘인디 영화’ 위주로 상영했다. 웬만한 영화관에서는 보기가 거의 불가능한 영화들이 한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본 영화 중 나는 무당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가장 인상 깊었다. 그 외에도 수십 편의 국내외 단편 영화를 봤다. 전주영화제는 세계관을 넓혀주는 다양한 영화들을 분별 있게 선정해 영화제 기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고, 그 점이 참 고마웠다.
그해 가을 한국에 놀러왔던 벨기에 친구 3명을 데리고 부산영화제에 또 갔다. 그때는 여러 영화를 예매해 놓고 오전부터 열심히 관람했다. 밤에는 부산 이곳저곳에서 놀다가 해운대 모래 위에 옷을 전부 벗어 놓고는 영화제 뒤풀이라도 하는 듯 ‘자정의 해수욕’을 하기도 했다.
얼핏 기억을 되살려보면 ‘영화제 바이러스’에 걸린 이후 가본 영화축제는 서울독립영화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국제여성영화제, 이반영화제, 환경영화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등이다. 그런데 그 많은 영화제 중 부끄럽게도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다. 아직 한국을 떠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레고리 림펜스 벨기에 출신 열린책들 해외문학팀 차장
림펜스의 한국 블로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림펜스의 한국 블로그]판정에 흥분하는 한국인 vs 자책하는 서양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6/06/14/78645043.1.jpg)

![“제 패스 받아서 골이 터지면 이강인 부럽지 않아요”[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0612.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