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안도감을 느끼는 이유는 뻔하다. 이라크전쟁 때문임을 누구나 안다. 북한이 이라크와 같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미 지도자들의 발언은 우리 귀에 북한을 이라크처럼 공격하지는 않겠다는 약속으로 들린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긴 해석이기는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다짐으로 이해하고 싶다.
이라크전쟁에서 드러났듯이 국제사회의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다. 그리고 북핵 문제는 이미 국제적 이슈가 됐다. 그렇다면 선택은 외길이다. 칼을 뺏으려는 불가능한 싸움에 매달리기보다는 미국이 말로 하는 다짐을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기회가 올 때마다 북한을 이라크와 구별하도록 유도해 미 지도자들이 일구이언을 하지 못하게 몰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요즈음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절감한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이라크 국민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만약 이라크 국민이었다면 ‘똑똑한’ 폭탄에 맞아 팔다리가 잘리는 ‘아둔한’ 인간이 될 수도 있고 가택수사에 나선 미군의 총부리에 놀라 두 손을 들고 오들오들 떠는 이라크 아이들이 내 자식이 될 수도 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는 말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잘 익은 포도주처럼 음미하면서 깨쳐야 할 뜻을 더 지니고 있다. 이라크는 멀리 떨어진 ‘남의 나라’지만 북한은 우리의 반쪽이다. 이산가족들에게 북한은 아직도 혈육이 살고 있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먼 나라 국민이 겪는 전쟁의 참화를 감지할 가슴이 있다면 굶주리고 박해받는 혈육들의 고통은 더 절실히 느껴야 한다.
사흘 전 3명의 탈북자가 동해안에 도착했다. 1년에 1000명이 넘는 탈북자가 귀순하는 시대가 됐다지만 그들을 맞는 태도는 너무 형식적이다. 거리에는 파병반대와 반전시위에 열심인 박애주의자 평화주의자들이 넘치는데 북한 주민의 비인간적인 삶을 개탄하는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 이해하기 힘든 모순이다.
이라크는 독불장군으로 지내다 미군의 힘에 짓밟히고 있다.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미국의 능력을 오판하지 않았다면, 미군이 진주하자 그의 동상을 쓰러뜨리며 독재에 대한 분노를 발산하는 국민의 진심을 미리 간파했다면 오늘의 불행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과 이라크 구별론이 안도감을 주는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북한이 이번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변하기를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라크와는 다른 길을 가도록 권고하고 유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방형남 논설위원 hnbhang@donga.com
오늘과 내일 >
-

전문의 칼럼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만화 그리는 의사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유재동]尹이 한때 꿈꿨던 정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2/11/13062497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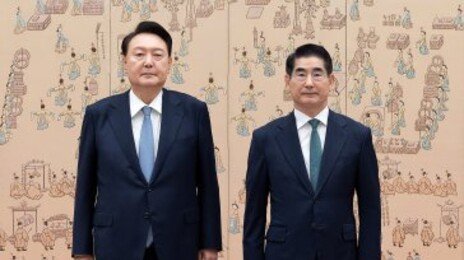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