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꼭 100살을 맞은 베니스 비엔날레는 ‘미술 올림픽’이라 불리는 국제 행사다. 갈수록 행사가 정체성을 잃고 문화패권의 다툼장과 고급 사교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는 비판도 거세지만, 때로 전통은 곧 권력이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최대 폭서(暴暑)’라는 과장 섞인 말이 나올 정도의 폭염 속에서도 비지땀을 흘리며 전시장을 돌아다니는 인파를 보고 기자는 ‘베니스의 힘’이 건재함을 절감했다.
그럼에도 올 행사의 전반적인 수준은 많이 떨어졌다는 평이 많았다. 지난 회까지만 해도 제3세계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 청년 정신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엿보였지만, 올해는 유난히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여론이다. 개막행사 후 인근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를 둘러본 국내 일부 미술계 관계자들도 “베니스 비엔날레가 이제 아트페어 수준보다 못하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한국관을 둘러본 사람들의 실망이 컸다. 우선 전시공간이 협소하고 그마저 여러 부분으로 쪼개져 누가 커미셔너를 맡아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독립 전시관이 없어 이탈리아관 안의 작은 공간을 배정받았던 시절에 비할 바가 아니고, 95년 건립 당시의 신화에 가까운 관계자들의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왕이면 건축물 자체의 아름다움보다 전시공간으로서의 실용성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
여기에 전시작품들도 예년에 비해 ‘심심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나마 기대를 모았던 작가의 작품도 공간에 압도돼 공간과 기획에 따라 작품이 얼마나 다르게 보일 수 있는가를 역으로 보여 줬다.
한국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1인 커미셔너 제도를 3인 정도로 늘려 작가 선정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국제 경험이 풍부한 전시기획자가 부족한 한국적 상황에서는 당분간 어쩔 수 없으니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장단기적 대책이 모두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다만 전시 장르의 다양성을 주문하는 목소리에는 이견이 없었다. 한 미술계 관계자는 “올 베니스 비엔날레 자체가 설치나 미디어보다 회화의 비중을 늘렸는데 유독 한국관만큼은 거의 매회 설치작품을 선정하고 있다”며 “서구 미술의 아류를 따라잡느라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한국적 정체성과 자신감을 대표하는 회화나 사진 등 평면 작가에게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아트페어’도 외형적 규모는 해외 아트페어 수준이지만 운영이나 작가 선정에 있어 허술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면서도 심의나 자격제한 없이 부스비만 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어 행사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것. 참고로 세계 최고의 아트페어로 꼽히는 바젤 아트페어는 매년 참가신청을 내는 전 세계 900여개의 화랑 중 200여개만을 엄선해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삶과 문화 >
-

소소칼럼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삶과 문화]"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여…"명창의 큰 울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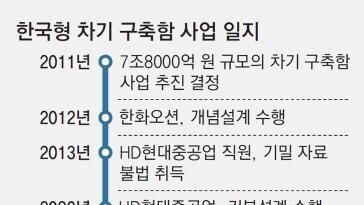


댓글 0